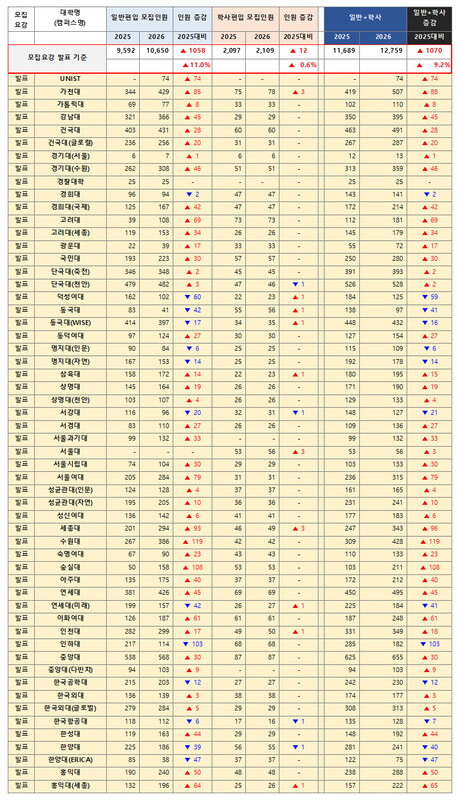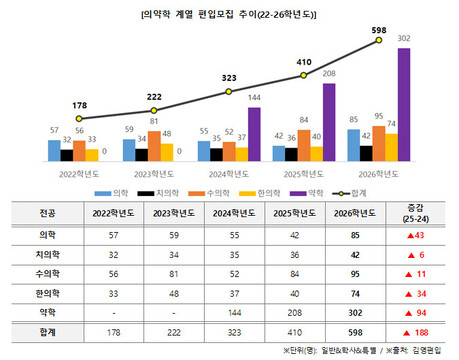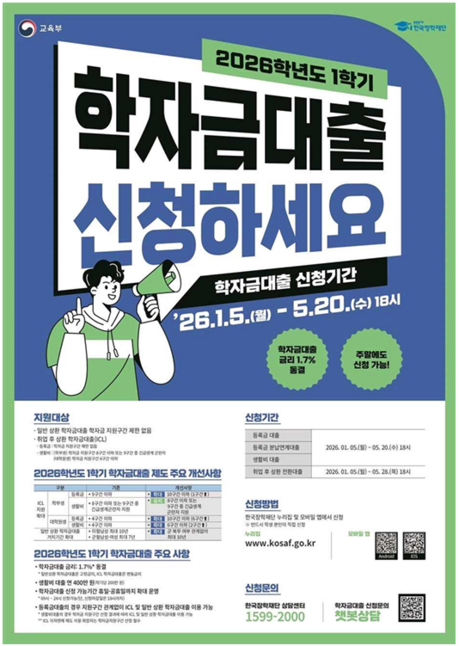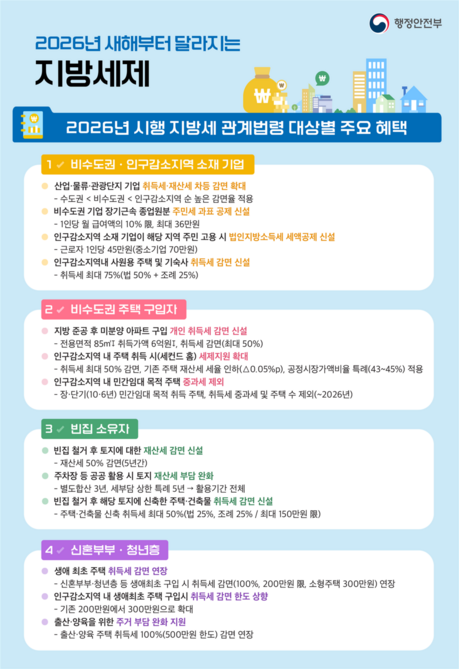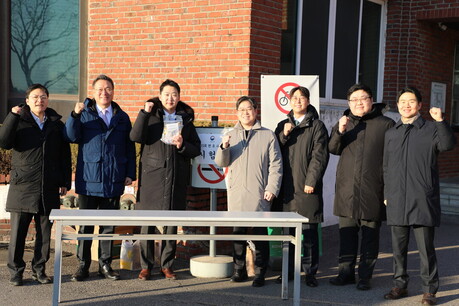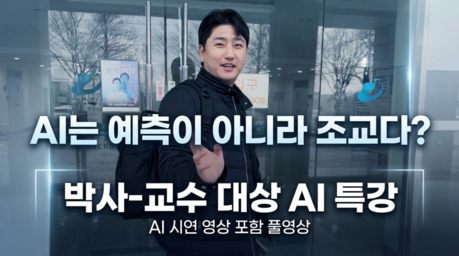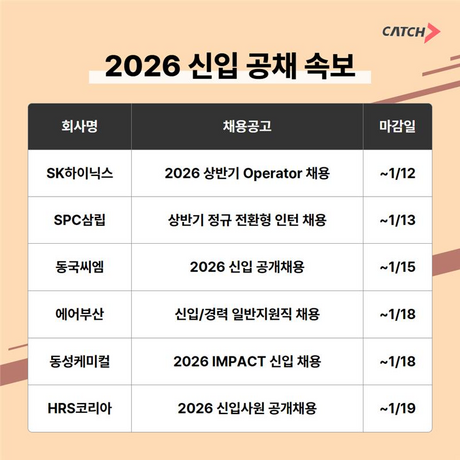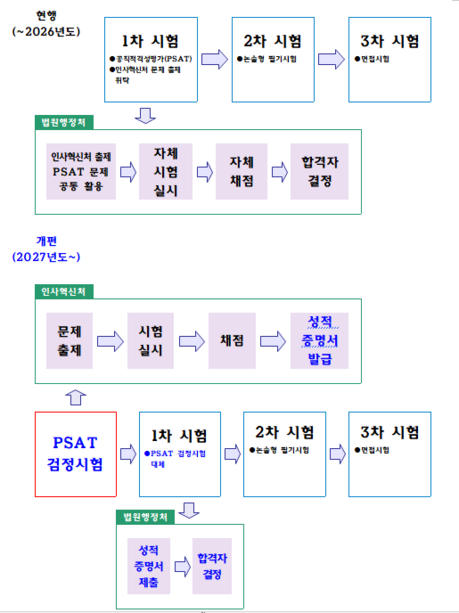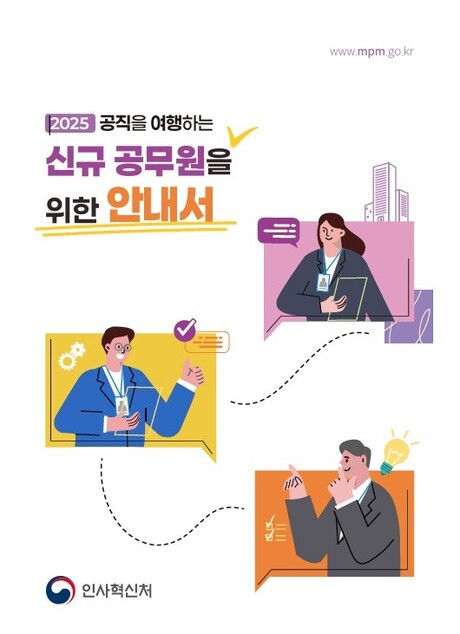좋은 수필 쓰는 법?(2)
김문호
 |
저번에 언급했던 송나라 구양수의 삼다 즉, 열심히 읽고(看多), 깊이 생각하며(商量多), 많이 쓰기(做多) 중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읽을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글 속에서 저자가 인용하는 책이라면 실속 있는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주위의 독후감이나 권유 또한 고마운 일이지요. 그리고는 일간지 등의 신간 소개를 살피는 일입니다. 맘에 드는 제목을 오려두었다가 서점을 지나는 길에 입구의 여자 점원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단한 서가들을 부대끼며 헤맬 일도 없고요.
인천으로 출근하던 시절에는 그곳 지하철역 앞의 한 서점이 생광스러웠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면서도 맑은 얼굴에 눈웃음이 천진한 여자 직원이었지요. 주인 언니를 돕고 있는 그녀의 책에 대한 지식이 놀라웠습니다. 국내 유통망과의 소통도 좋아서, 신간이든 절판본이든 부탁만 하면 척척 이었지요. 동대문 헌책방 거리에도 없는 처칠의 2차대전 회고록 같은 것도 부산 어디에서 구해 주곤 했으니까요.
문방에 네 벗(文房四友)이라면 내 책상에도 두셋 도우미가 있습니다. 광도 좋은 전기스탠드와 잘 닦은 안경, 만년필 아니면 볼펜이지요. 앞의 둘은 어느새 깊숙한 노안의 시력을 돕는 것이고 필기구는 하루가 다르게 깜박이는 기억력의 방책입니다.
중요한 구절에는 밑줄을 치고 기억해야 할 연대나 고유명사는 네모로 쌉니다. 다시 읽고 싶은 내용에는 문단 전부를 사각형으로 두르고 별을 그려 붙입니다. 더욱 멋진 곳에는 큼직한 별 하나를 더하고요. 그러나 저자의 의도나 표현이 미심쩍은 구절에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매끄럽지 못한 문장은 고쳐 쓰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생소한 단어들을 아래위 공간에 나열하고 사전의 뜻풀이를 붙이면서, 저명인사의 역저를 낙서투성이로 훼손하는 결례까지도 저지르게도 되는 것이지요.
낙서 부분들을 중심으로 두어 번 더 훑고 나면 다음에 읽을 책이 떠오르면서 고칠현삼(古七現三)이니 다독, 정독이어야 한다는 등의 현학들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서가로 간직하면, 범람하는 지식정보의 물결에서 자꾸 밀려나는 나로서는 더없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누구에게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지럽게 갈긴 낙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돌려받지 못해서 새 책의 줄 치기를 재탕할 일이 더욱 그렇거든요.
오늘처럼 다양한 지식정보 시대에는 독서의 범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영상이며 전자매체 또한 독서의 일익으로 봐야 할런지요. 출판 문화의 영역이 빠르게 좁아 드는 시속에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의 문학기행에 편승했더니 인솔자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라고 하더군요. 내가 오지랖 넓게 걸고 들었지요. 독서가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여행을 책 읽기보다 앞에 둬야 한다는 은연의 발로였던 것인지요.
연암 박 지원의 『열하일기』가 우리 수필 문학의 첫 봉우리라는 생각입니다. 일망무제의 요동 벌을 만나면서 울음 한번 크게 울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울음은 인간의 칠정(七情)에 두루 있는 것이어서 천고의 영웅이 잘 울었고 미인도 눈물이 많은 법이라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슬픔에만 배치하려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의 첫울음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둡고 갑갑한 곳에서 넓고 환한 세상으로 나오면서 팔다리를 펴고 해와 달, 부모를 만나는 감격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의당 갓난아기들처럼, 비로봉 마루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울어볼 만하고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 해변을 걸으면서도 크게 울어볼 만하며 이곳 요동 벌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 1천2백 리 사방에 하늘과 땅끝이 맞닿아 창창할 뿐이니 이 또한 한 바탕 크게 울어볼 만한 곳 아니겠소.”
대동강변의 모란봉 부벽루에는 고려의 한림학사 김황원의 시가 걸려있답니다.
긴 성벽 한편의 도도한 강물(長城一面溶溶水)
넓은 들판 동쪽의 산, 산, 산(大野東頭點點山)
천하절경을 더는 읊을 길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붓을 놓고 내려왔다는, 고금의 절창으로 회자되는 반쪽짜리 칠언절구입니다. 바다에 다름없는 요하를 건너고 지평선에서 해가 뜨고 지는 달포의 여정 끝에 산해관의 만리장성을 만나는 선생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부벽루 절창 시의 장성이며 용용수, 대야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창공을 비상하는 쾌거였을까요. 아니면 우물 안 개구리를 자각하는 비애였을 런지요. 아마도 둘 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슬픔과 기쁨은 한 뿌리라고 했던가요.
삶의 환희와 비애를 자기 울음으로 풀어내는 것이 수필인가 합니다. 여행은 울음을 숙성시키기에 손색없는 효모인 것 같고요. 아무리 지구촌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넓고 인문의 역사며 자연의 경이는 도처에 산재하는지요. 그러면서 여행은 세상을 거쳐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렌, 또 한 번 실없는 짓거립니다. 삼복염천에 무슨 독서니 여행이라면서 자판을 두드리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모를 것은, 열대보다 지독한 열대야로 잠을 설치면서도 더러 첫새벽 서재로 나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도 않은 나이의 소치인지요. 그러면서 벽에 걸린 한문 족자 구절이 눈에 잡힙니다.
삼경에 등불을 켜서 첫닭 우는 오경까지(三更燈火五更鷄)
사내대장부의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正是男兒讀書時)
당나라의 서예가 겸 시인 안 진경(顔眞卿)이었던가요. 아득한 시공 저편 고인의 삶이 오늘의 내게 겹친다는 인식이 새롭습니다. 미증유의 폭염에 이만한 골몰도 다 그런 인연에서 비롯하는지요.
지난날 걸음이 불편하던 서점 처녀의 모습이 아련합니다. 국문학과 4년과 졸업 후의 그만한 시간, 어쩌면 문학소녀의 사춘기까지도 책만 읽었던지, 세상에 모르는 책은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책을 권하기도 하면서 그녀가 구해 준 것이 백여 권에 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수술을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한다고. 큰 수술이라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렌, 그때 그녀로선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의 계절이었던지요. 그녀 또한 어느덧 어디에서 초로를 앓고 있겠네요. 꽃과 이파리만 피우고 지우는 줄 알았던 세월이 우리 모두를 이토록 깊숙이 저마다의 오솔길로 데려다 놨습니다. 갈수록 좁고 가팔라지면서 가시덩굴이 할퀴며 막아서는 외롭고 두려운 산길. 힘겹더라도 맑고 고우소서.
김문호
한국해양대 졸업
대한해운공사 선장
한일상선회장
한국문협 해양문학 연구위원장
수필집 '윌리윌리' 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