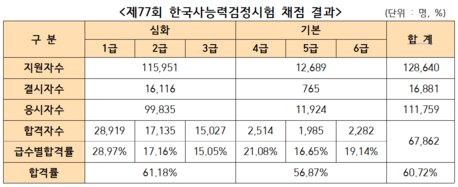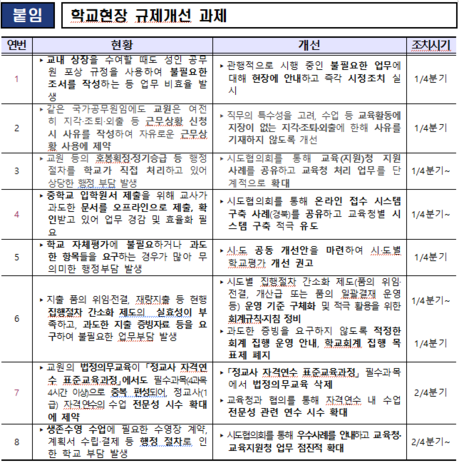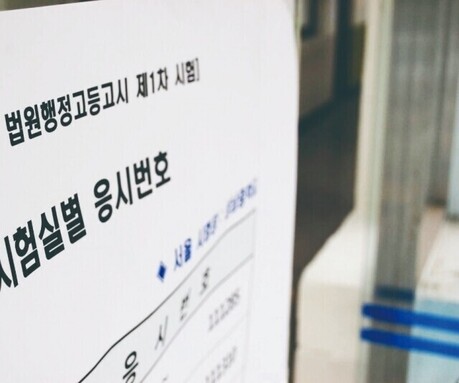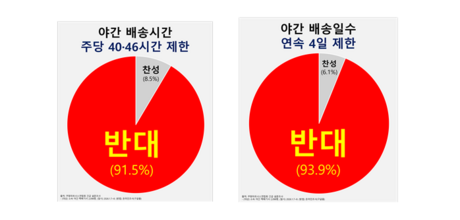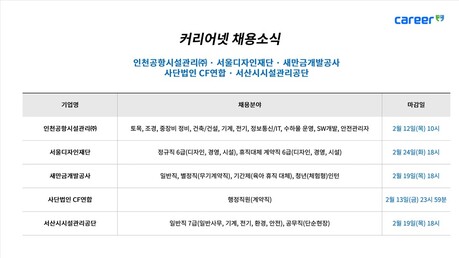[김문호 에세이] 좋은 수필 쓰는 법?(3)
김문호
 |
압록강을 건너고 난 보름여의 풍찬노숙(風餐露宿) 끝에 요양 지방으로 들어서자, 마을들이 이어지면서 연도의 주민들이 일행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사신행차에 익숙한 듯, 스스럼없는 친절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는 일행에게 차를 내거나 가벼운 술대접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설픈 조선말 몇 마디까지 동원하는 그들의 호의에 노림수가 없지는 않은 듯했습니다. 일행의 휴대품인 청심환이나 부채(高麗扇)가 그들에겐 진귀품이었으니까요. 어쩌다 좋은 글이나 글씨를 받게 되는 횡재수도 있었고요. 그들은 갓을 쓰거나 말을 탄 조선의 양반들은 누구라도 대단한 한학자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신민둔(新民屯)이라는 곳의 한 가게에서였지요. 석 자 길이로 자른 백로지(白鷺紙)를 펼치면서 문 위에 붙일 액자를 써달라는 주인의 간청에 붓을 들었습니다. 도중 어느 가게의 주련에서 봤던 ‘欺霜賽雪’ 넉 자를 써 줄 요량이었습니다. 자기네 장사 심지는 희고 맑기가 서리를 넘어 눈과 비견할 만하다는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줄을 잡으면서 첫 글자 ‘雪’을 쓰자, 기막히다는 탄성과 함께 길가의 구경꾼들이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欺’자를 썼을 때는 하나같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고요. 그냥 두고 보라는 한 마디를 던지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올 밖에요. 무식한 만주족 되놈들이 뭘 알겠느냐고 업신여기면서.
이튿날은 비녀, 팔찌, 가락지 등 부인네들의 장식품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주인의 간청으로 주련 두 폭을 쓰자, 구경꾼들의 함성에 푸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연거푸 마신 몇 잔으로 불콰해지면서 어제의 당혹을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주인에게 액자를 자청해서 똑같은 넉 자를 써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큰둥한 반응은 매일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했지요. 자기네 가게는 국숫집이 아니라고.
연습 삼아 써 본 것이라 얼버무리면서 다른 것으로 써주고는 더욱 큰 갈채와 대접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 이국의 문물을 좁은 소견의 잣대로 재단하려 했던 우물 안 개구리의 경망이 등줄기의 땀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국수라는 넉 자의 뜻도 몰랐으면서 말입니다.
덮어도 좋을 남우세거리를 써서 남긴 파격이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체면과 형식이 실체보다 중시되던 당시의 세태에 말입니다. 난생처음 응시한 과거에 낙방을 하자, 평생 공부하던 서책을 내던지면서 황해도 연암(燕巖) 골짜기의 농사에 걷어붙인 천성의 기백이었던지요. 수필은 사람이며 삶의 고백이라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33참(站) 2020리, 연경에서 열하까지 또 6백여 리의 이국 풍물이 경이로웠습니다. 무변광야 변방의 농가주택들부터 그랬지요. 하나같은 벽돌 건축으로 간(間)의 넓이와 지붕의 높이를 같이하면서 화재와 외부 침입에 대비하는 구조였습니다. 방구들을 놓으면서 개자리를 깊게 파고 옆으로 바람이 들지 않는 굴뚝을 높게 쌓으면서 아궁이의 불길이 잘 들게 하는 원리 또한 절묘했고요.
마을들이 이어지면서 폭을 더하는 도로의 수레 행렬은 감탄을 지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도 그렇게만 된다면, 바닷가 사람들이 거름으로나 쓰는 세우나 정어리가 서울에서 한 움큼에 한 푼씩 하는 부조화는 없을 것이니까요. 거기에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축의 길이를 하나로 통일(車同軌)한 것이 절묘의 극치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수레바퀴 자욱이 한 줄로 되면서, 그 자리만 벽돌이나 기왓장 조각으로 메우면 우천으로 땅이 질어도 수레의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이에 대한 일갈을 빠뜨리지 않았지요.
“우리나라는 길이 험해 수레를 쓸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수레를 쓰지 않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은 것 아닌가.”
제주도의 조랑말까지도 각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이 일본을 치기 위한 준비로 갖다 놓은 호마(胡馬)가 종자 개량 없이 방치되면서 지금의 조랑말로 퇴화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암수 종마를 수입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사신들의 귀로에 교통 마로 한 마리씩 타고 오든지, 아니면 밀무역에 능숙한 의주 상인들에다 부탁을 넣어서라도 말이지요.
『열하일기』가 우리나라 수필 문학의 효시이자 금자탑이라는 말에 이의의 여지는 없습니다. 삼종형의 사신행차에 따라나섰던 다섯 달 이국 여행의 산물이었지요. 그렇다고 여행이 곧 수필이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300여 일행 중, 직품이 대단한 정사, 부사, 서장관까지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머리를 깎는 되놈의 나라에 무엇 하나 배울 것이 있느냐”면서 도리어 비아냥거렸으니 말입니다. 여행 또한 깨어있는 만큼만 보이는 것인지요.
책이 나오자 당시 사대부들이 앞장서서 환호했습니다. 이국의 낯선 문물들을 전혀 새로운 문체로 펼쳐 보였으니까요. 중국 수필의 비조 당송팔대가들이 그랬듯, 그야말로 문체반정(文體反正)의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제가, 홍대용, 이덕무 등의 서학 내지 실학에 힘을 보탠 시대의 선각이었지요.
옛 그리스에 소요학파라는 일단이 있었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강의와 토론을 걸으면서 하는 학파였지요. 아테네 교외의 산이나 강, 들판이 주 학습장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는 건물의 복도나 회랑이라도 걸으면서 말입니다. 걸으면 두뇌활동이 촉진되면서 생각이 맑아진다는 근거였지요. 유명한 ‘칸트의 산책’이며 우리네 단풍길 고운 소요산이 다 그런 연유인지요.
어린 시절의 천자문 책에도 산려소요(散慮逍遙)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한가하게 걸으라는 뜻이지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온 것으로 이때의 ‘유(遊)’는 완벽한 자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라 합니다. 그만한 경지야 가늠할 길 없지만, 소요 또한 여행의 한 형태가 아닐런지요.
렌, 나도 가끔 자판을 두드리다가 막히면 뒷산을 걷습니다. 능선과 계곡을 호흡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자판의 맥이 툭 터지기도 하거든요. 새벽마다 찾는 산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새로운 햇살과 바람, 풀 나무들의 선물이겠지요.
밭농사의 효험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명의 고속도로를 시간여 달리면 간밤의 안개가 아직도 눌러앉은 산촌입니다. 드문드문 농가의 새벽닭 목청에 밭고랑을 타고 앉으면, 어느새 앞산 머리의 햇살이 안개를 밀어내면서 환한 새벽이 열리고 한나절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고이는 생각의 주저리를 대충 기억했다가 정리하면 농사와 자판일 중 하나는 거저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뒷산이나 밭뙈기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태양이 남반구의 극소점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둡고 시린, 그야말로 암울의 계절입니다. 밤이 낮보다 네 시간도 더 길면서 햇살과 풀잎이 없는 새벽은 나의 새벽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농사와 자판 작업이 겨울잠에 든 것입니다. 나 또한 개구리나 뱀처럼 그렇고요. 그렇다고 행여 나를 위한 상심은 마십시오. 이제 곧 밤을 걷어내는 종소리와 함께 나이 하나를 더 먹고, 힘겨운 포만(飽滿)을 되새김질하다 보면 어느새 봄도 올 것이니까요. 그러면 나도 어느 시인처럼 눈이 밝아져서 부지런히 죄를 짓게 되겠고요.
농사의 태반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밭두둑을 검은 비닐로 덮습니다. 햇살과 공기, 빗물을 차단하면서 잡초란 아예 씨를 말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게도 권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잡초와의 싸움이 없는 농사를 농사라고 할런지요. 터전인 땅까지 질식시키면서 말입니다.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들의 플라스틱 걸상을 밭고랑에다 놓고 다리를 편 자세로 걸터앉으면, 웬만한 잡초 사리로는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파헤쳐지는 흙냄새와 풀뿌리의 향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작업량을 욕심낼 일은 아니지요. 내일의 일거리는 아껴 두어야 하니까요.
다 매고 난 이랑을 돌아보는 마음이 산뜻합니다. 없던 땅을 찾아낸 듯 흐뭇하기도 합니다. 흙의 속살은 어찌 그리 곱고도 향기로운지요. 그러나 한편, 고랑에서 마르는 잡초들 보기가 편치 않습니다. 땅의 원주인은 그들이었다는 생각이거든요. 온갖 풀들이 저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대대손손 살아온 그들 삶의 터전이었지요.
그곳을 인간들이 파헤치고 자기네 씨앗을 뿌린 겁니다. 갖은 풀들은 잡초 아니면 김이라는, 이름도 아닌 이름으로 몰아쳐 파내면서 말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퍼뜨린다면서 십자가 돛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간 사람들이 그곳 원주민들을 학살한 역설과도 흡사할 런지요. 나 또한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짓듯 말입니다.
렌, 또 한 해가 가네요. 여리고 고운 심성으로 세상을 보면서 상심이 지나치실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기도한들 우리네 죄가 다할 리 있겠습니까. 매고 나서 돌아서면 도로 무성해지는 밭이랑의 잡초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시인의 심성으로야 이 세상 어디 죄 아닌 것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부디 많은 죄를 지으면서 건안하소서.
김문호
한국해양대 졸업
대한해운공사 선장
한일상선회장
한국문협 해양문학 연구위원장
수필집 '윌리윌리' 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