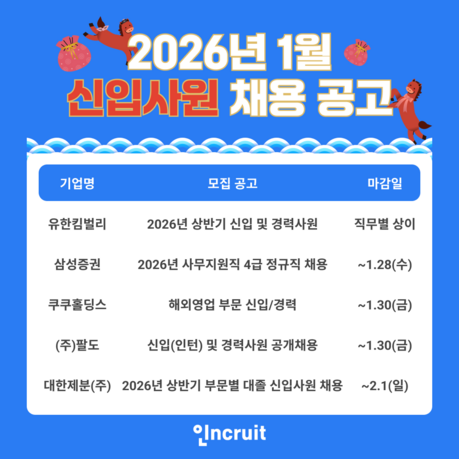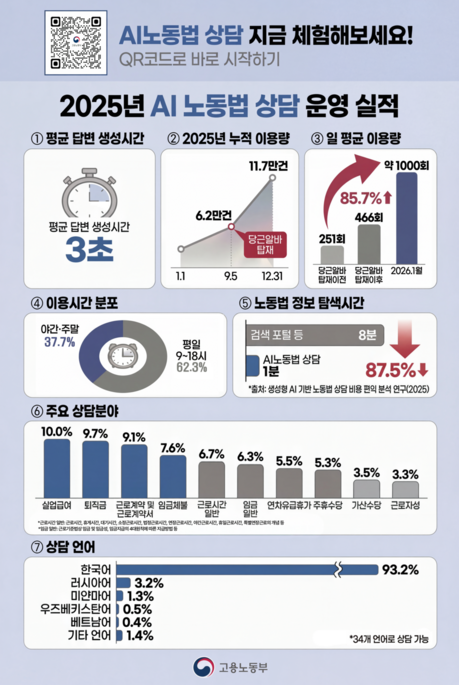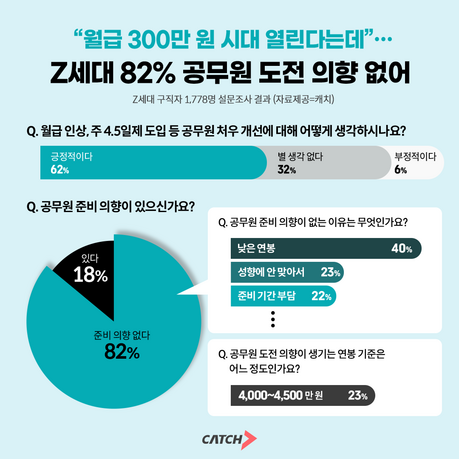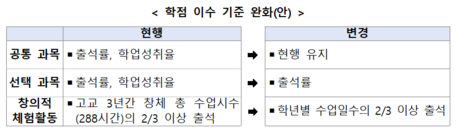|
| ▲김경애 작가 |
간밤에도 꿈을 꾸었다. 후미진 옥이네 집 언저리와 그녀의 우중충한 표정과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군화처럼 나를 짓눌렀다. 한참동안 용을 쓰다 깨어 보니 꿈이었다. 어린 날의 옹이가 문신처럼 나를 따라다니는가 보다.
그때가 언제쯤일까, 아마도 내 나이 열 살은 채 안 됐을 것 같다. 내가 살던 이북 땅, 그때 일을 떠올리면 나의 유년은 무거운 잿빛이었다. 매일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나를 슬프게 했기 때문이리라.
해방 후 일이 년이 지나자 부모님은 큰언니와 두 오빠를 남한으로 보냈고 나와 작은언니는 어렸기에 이북 땅에 그냥 남겨두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산가족이 됐고 ‘웃음’이란 단어는 먼 나라의 전설이 되어버렸다. 자식 셋을 품안에서 갑자기 놓아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어린 내가 어찌 가늠이나 했을까. 학교에서 돌아가면 부뚜막에 망연자실 앉아있던 어머니는 행주치마에 콧물인 듯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곤 하셨다. 어머니의 눈가는 늘 젖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어슴푸레 잠이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듣게 됐다. 자식들에게 보낸 학비를 인민군이 다 빼앗아 갔다는 내용이었다. 한참동안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어머니는 흐느꼈다. 나직한 말이 잘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달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에야 어머니에게 언뜻 스쳤던 ‘부뚜막 눈물’의 뜻을 알게 됐다.
얼마 후, 어머니는 더 기막힌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역시 캄캄한 방에서였다. 큰오빠는 학비가 없어서 이집 저집 화장품을 팔러 다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귀를 바싹 기울였다. 그 밤엔 아버지도 우시는 것 같았다. 나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천장이 슬그머니 내려와 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런 소식은 어떻게 전해오는지, 학비는 어느 편에 보내는지 한참 후에야 나는 알게 됐다.
고향 함흥에는 ‘새 거리 시장’이라 부르는 제법 큰 재래시장이 있었다. 철물상이었던가, 컴컴한 가게를 왼쪽으로 끼고 돌아 조붓한 뒷골목에 들어서서 얼마쯤 걷다가 막다른 곳에 이를 즈음, 왼쪽 집 낡은 대문을 열면 그곳에 옥이 엄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38선을 넘나드는 안내자였다. 칙칙한 피부에 움푹 파인 두 눈, 불거진 광대뼈 밑에 푹 꺼진 볼, 거기엔 검버섯이 꽤나 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녀의 쫓기는 뜻한 눈빛을 보노라면 어느새 내게도 불안이 몰려왔다.
해방 직후, 그때 만해도 38선 경비가 삼엄하지 않아 육로陸路로 월남하는 일이 그런대로 가능했다고 한다. 아마도 부르죠아층을 이북에 놔두면 골칫거리가 될까 염려스러웠을 지도 모르겠다. 옥이엄마는 길 안내자다. 그 편에 학비와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번번이 인민군 경비원에게 돈을 다 빼앗겼다는 것이었다. 아무 증거 없으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정말 어이없는 노릇이다.
옥이 엄마가 돌아올 때가 됐겠다 싶은 날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게 심부름을 시켰다. 항상 땅거미가 내려앉는 어둑한 시간이었다. 꼬불꼬불 골목을 따라 그 집에 다다르면 옥이 엄마는 영락없이 집에 있었다. 안방에는 내 또래의 아이들이 바글거렸고 알전구 밑 두레반상에서 네댓 명 아이들이 서로 다투어 저녁밥을 먹느라 시끌벅적했다.
내가 그 집 마당에 들어서면 옥이 엄마는 나를 힐긋 쳐다보고는 제 할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마당에 내려섰다. 언제나 똑같은 말, 돈을 몽땅 빼앗겼다는 것이었다. ‘호랑이를 만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앞으론 이 짓도 못해먹겠다’며 오히려 내게 푸념을 쏟아냈다. 순간 내 몸 속에 뭔가 쾅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다리엔 맥이 풀렸다. 사실이지 나는 그 비보를 전하는 일보다 어머니의 참담한 모습을 보는 게 더 겁이 났다. 그것은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었으리라.
하지만 그 일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맷돌처럼 무거웠고 터덜터덜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 내 발걸음엔 쇠뭉치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방금 전에 보았던 알전구 밑의 아이들이 그처럼 부러울 수 없었다. 비록 부실한 밥상이었지만 따스해 보였고 아이들 얼굴들은 아무 걱정 없이 반들거렸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내 입속은 바싹 말라들었다. 나는 차마 뗄 수 없는 입을 가까스로 열어 옥이 엄마의 말을 중얼거리듯 전했고 어머니는 그만 주저앉은 채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다. 분위기는 침통했고 모든 원인이 내게 있기라도 하듯 멀찍이에서 눈치만 살폈다. 그런 날이면 내 안의 연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도졌다.
다음 날 등교 시간이 늦어졌어도, 도시락 찬이 허술해도 아무 말 못했다. 나는 깻잎 반찬을 무척 좋아했는데 하굣길에 논두렁 가에서 치마폭에 깻잎을 한가득 따서 부엌에 놓고는 깻잎 반찬을 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숙제만 했다. 어쩌면 집에 곧바로 가기 싫어 논두렁에서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나도 한 차례씩 몸살을 치르는 셈이었다. 그런 고통을 몇 번이나 겪었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다.
‘죽기보다 더 싫은 심부름’을 어머니는 왜 막내인 내게만 시켰을까, 어린 내 마음을 알기나 하셨을까. 그때 나의 괴로움을 어머니에게 분명히 전했거나 적어도 그런 신호라도 보냈어야 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신호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랬더라면 우리 모녀는 각각 다른 아픔이지만 서로 부둥켜안고 울며 앙금을 씻어냈으리라.
그러나 바보처럼 나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 후 살아오면서 어린 날의 아픔을 푸념 삼아 어머니에게 털어놨을 뻔도 했는데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채, 홀연히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내 나이 마흔여덟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엔 그 회색빛 눅진한 영상이 내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 들어 그 어두운 기억들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치밀고 올라와 후렴처럼 나를 괴롭히곤 한다.
이제 깊은 수렁에 묻어두었던 사연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다. 새장에 갇힌 새 한 마리가 긴긴날 접어두었던 날개를 펴보려고 파닥인다. 작아서 애처로운 어린 새의 안간힘이다. ‘빛은 덤벼들고 행복은 스며드는 것’이라 했던가, 반짝 햇볕을 비춰주면 칠흑 같던 슬픔에서 놓여날 테고, 행복은 시나브로 스며들 것이다. 긴 날 힘들었겠노라고 맘껏 위로해주고 싶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