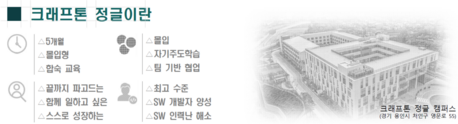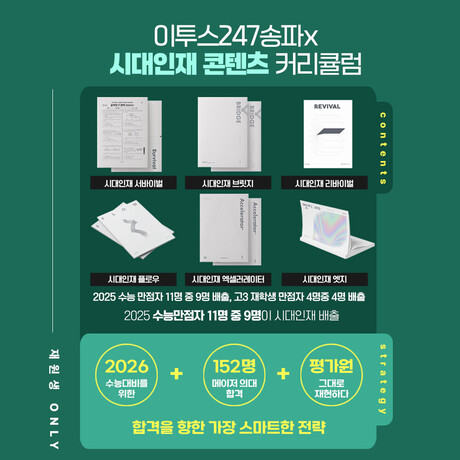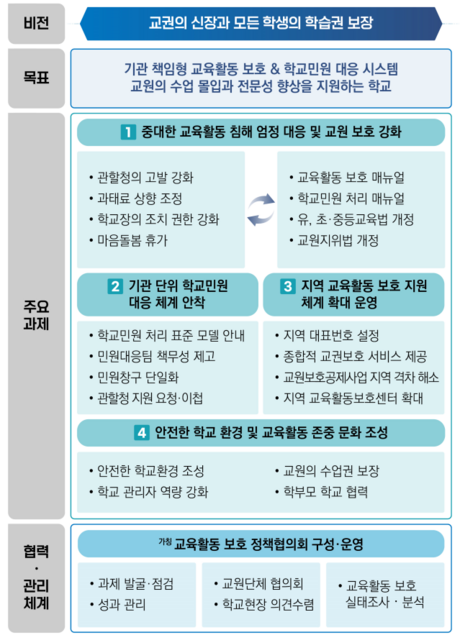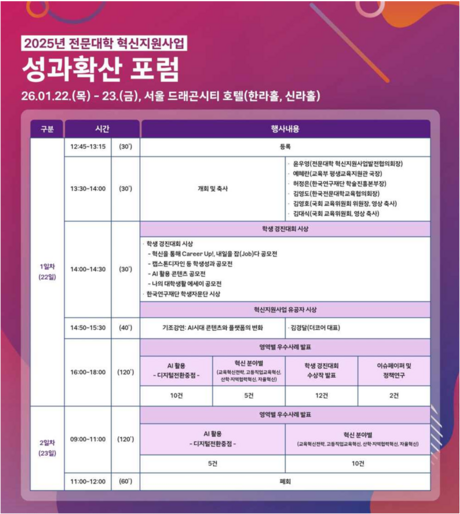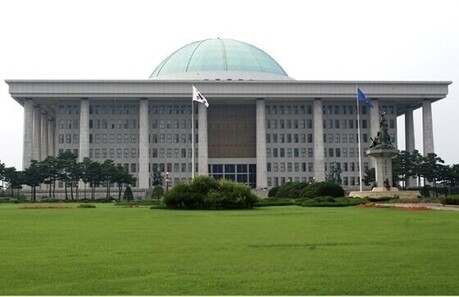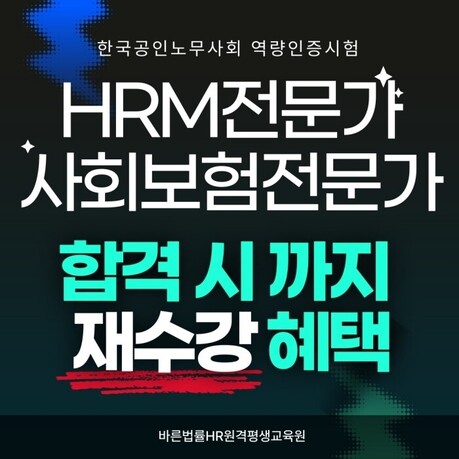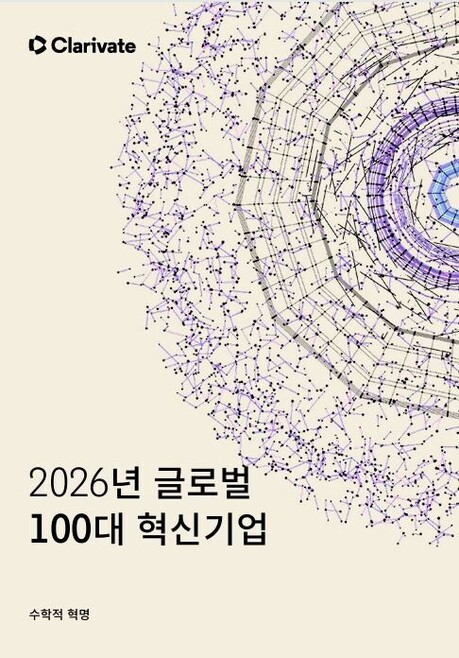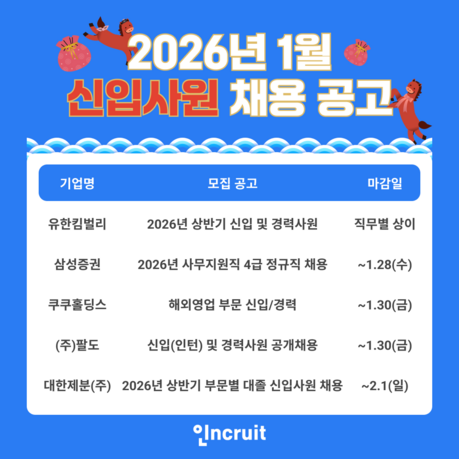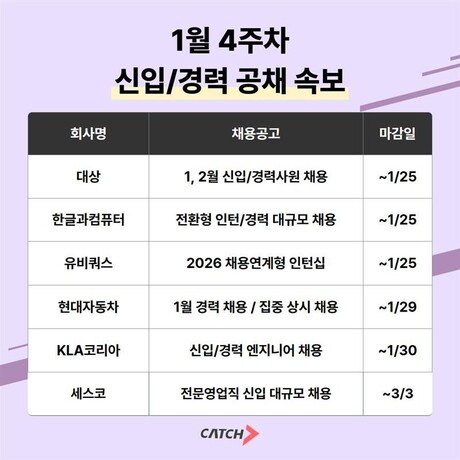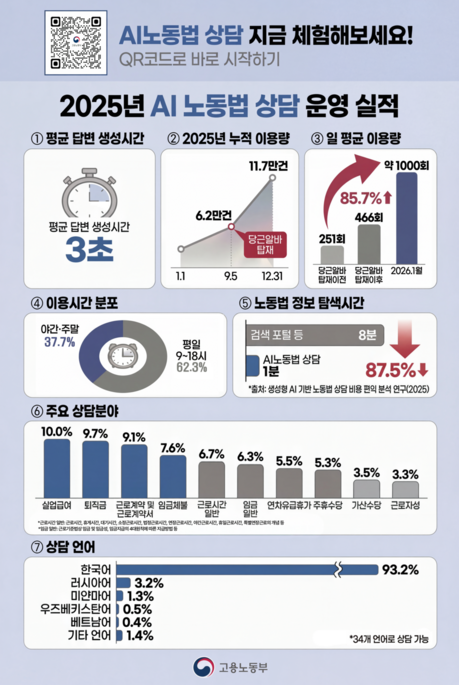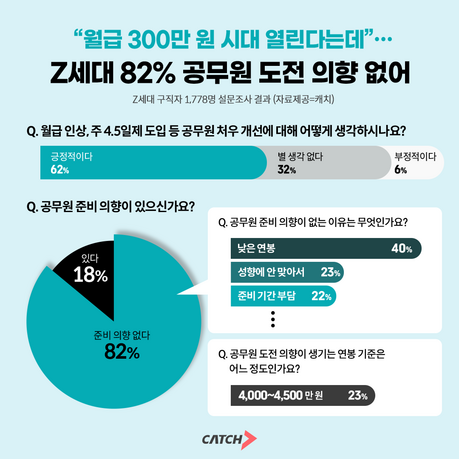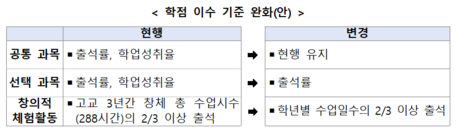“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法諺(법언)이 있다.
 |
| ▲ 최평오 교수 |
우리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종국판결 선고기간”이라는 표제어 하에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7조 제1항은 선고기일이라는 표제어 하에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거부와 관련하여 교수지위확인소송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훈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제199조, 제207조를 훈시규정으로 격하시켜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거나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훈시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관이 마냥 훈시규정을 무시함은 직무상 위법이 되고, 반법치주의라고 일갈하고 있다. 여하튼 대법원이 훈시규정에 대하여 이렇게 관대하게 재판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근자의 통계를 보면 제199조 및 제207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2년 이상 연기하는 민사사건도 1만 2281건 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22. 7. 28 자).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령 등과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법개혁 과제보다도 시급함을 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tech-giant인 Amazon은 lower cost, faster delivery, more accurate 정신으로 생산성의 제고를 꾀하여야 한다고 한다.
물론 신속한 재판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고심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대법관 수의 증원을 포함한 법관을 질적 양적으로 대폭 증원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항소심이 속심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후심제에 가깝게 운영하여 제1심을 충실화 할 것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 일단 접어둔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오래 전부터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3 참조)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의무와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여기서 항소이유서란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항소 의사 그 자체를 밝힌 항소장과 다른 서면인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항소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생략하거나 또는 간략히 적어 일단 제출하고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이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항소장을 제출되면 항소심에서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위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슨 制裁(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항소인은 항소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등”의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
그러나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에 위반하여 일정한 방식의 처음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항소 각하된다는 등의 제재가 없어 결국 제1심에서 패소하고도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장만 제출한 째 위 처음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이 지연되고 신속한 재판을 해치는 측면이 있었다. 실무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제2회 변론기일을 열게하여 고의로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제2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가 사건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무변론판결을 받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항소인이 처음 준비서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심 절차를 준용하여 변론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변론 항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에 최근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은 사실심인 항소심에서의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抗訴却下(항소각하) 決定(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400조, 402조의2, 3 참조). 다만 시행일은 2025. 3. 1.이다.
일본은 平成 8년(1996년)에 이미 최고재판소규칙(민사소송규칙) 제182조에서 控訴状に第一審判決の取消し又は変更を求める事由の具体的な記載がないときは、控訴人は、控訴の提起後五十日以内に、これらを記載した書面を控訴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때는, 항소인은 항소 제기 후 50일 이내에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매우 늦은 감이 있다(일본에서는 抗訴(항소)를 控訴(공소)라고 한다). Global Standard(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절차의 신속의 면에서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와는 달리 상고이유서에 대하여는 제출기간을 정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제출강제를 이미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서면 심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서면심리에 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와 법원의 부담 경감을 경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의 재판 지연 사례는 전 정부의 김명수 COURT에서 극에서 달해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몇 년 걸쳐 끝난 사건, 몇 년이 지나서 겨우 제1심 판결이나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인 최강욱 전 의원 사건, 황운하 의원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등.......필자는 이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번 조희대 COURT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또한 행정소송 등을 막론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자각하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권리보호 지연은 권리보호 거절과 같은 것”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늘 새기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사소송법 전공)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도산법학회 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연구센터 전임 연구원
한빛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2008.3∼201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