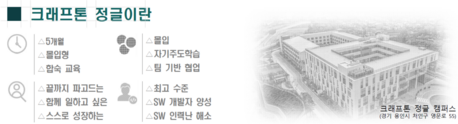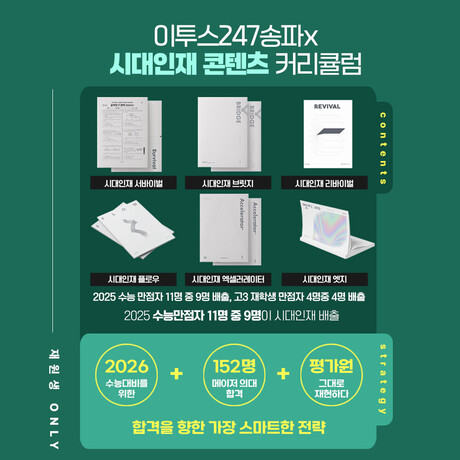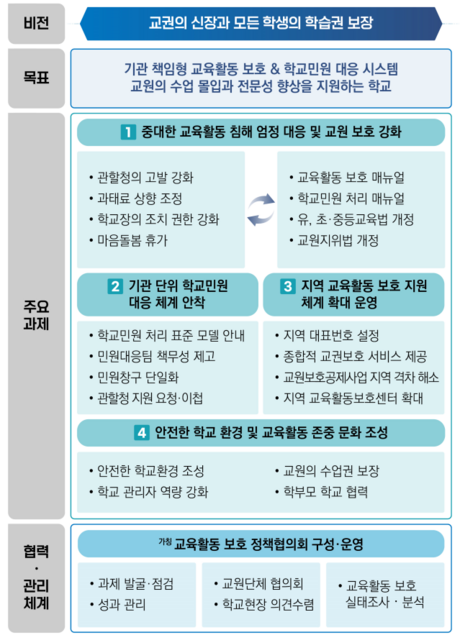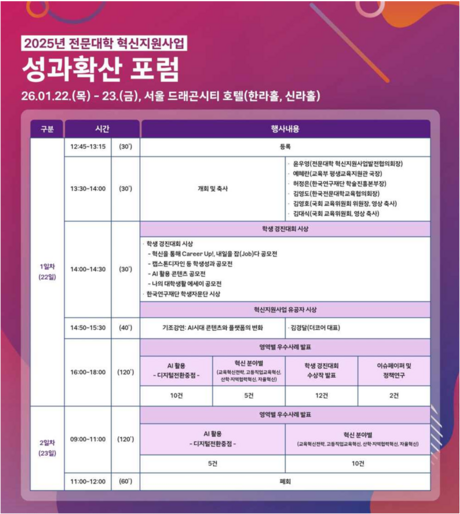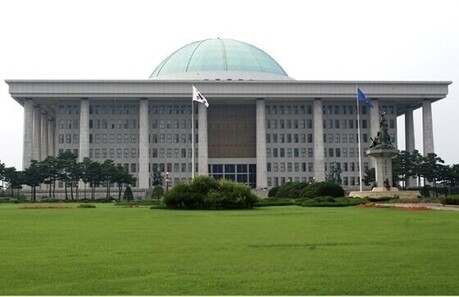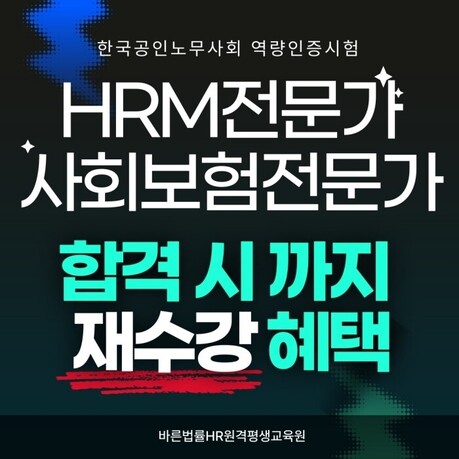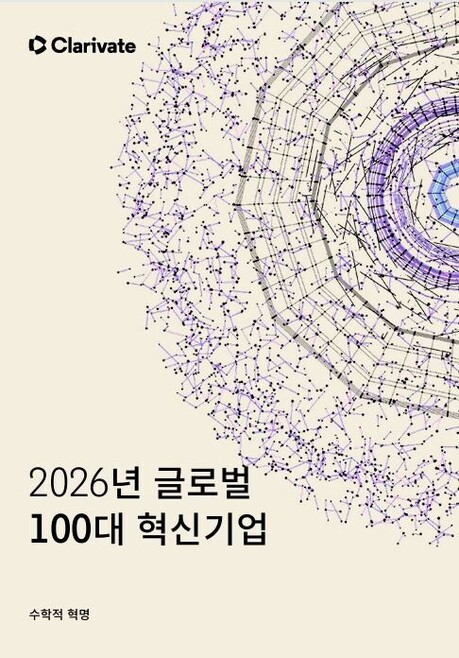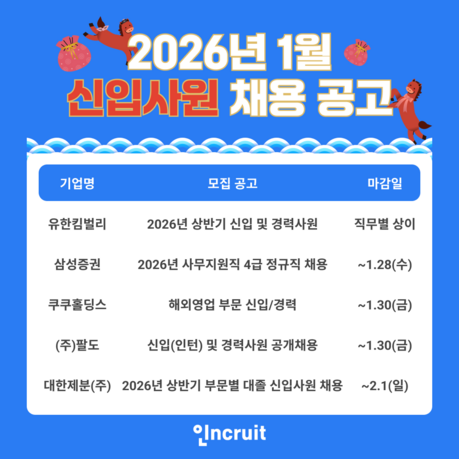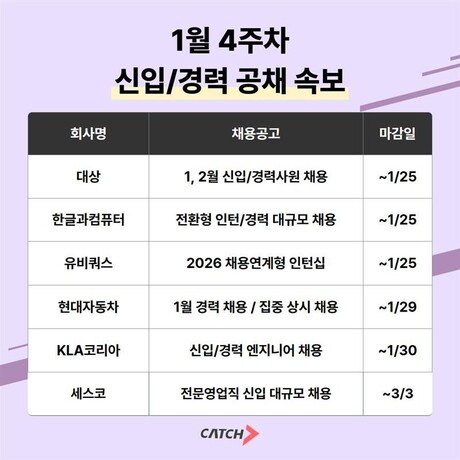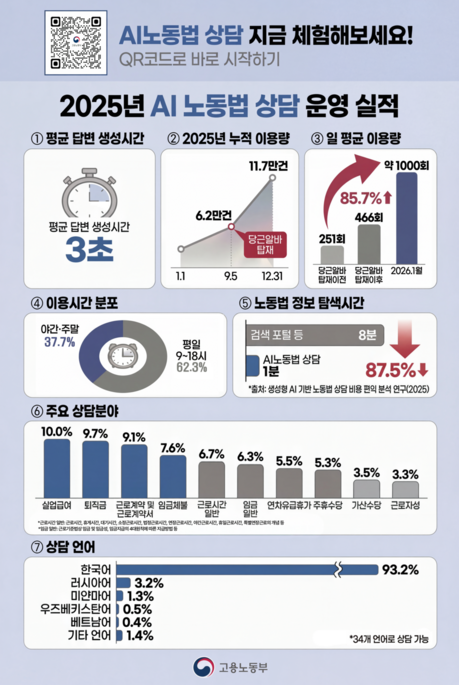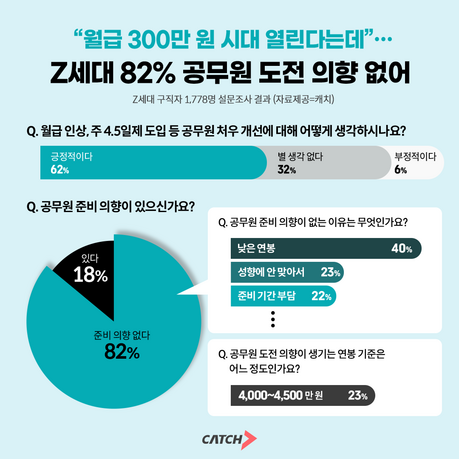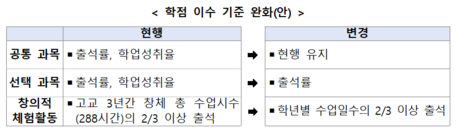|
1. 밥의 공동체인 가족
부모가 자식을 낳아 가족은 만들어진다.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고 키워내던 부모는 늙고 시들어 간다. 그렇게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는 『법구경』의 표현을 벗어날 길은 없다. 우리에게 가족은 생로병사,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공동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전통적 가족 개념에 가깝다. 서양의 근대를 모방하며 경제적 성장을 도모한 한국 사회는 서구 계몽주의자들이 상상으로 창조해 낸 ‘개인’을 받아들였고,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족의 해체’[“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해체는 물론 서구 계몽주의의 결과이다. 절대왕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계몽주의자들은 상상으로서의 ‘개인’을 창조하였다. 모든 것에 앞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이런 생각은 근대 이후 서구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 법률, 경제, 문화, 가족, 종교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제 개인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라 사회 해체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최석만, 「회고와 전망: 동양을 넘어 서양을 넘어」, 『동양사회사상』제16집, 2007.)]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6%가 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국가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영석 시인의 「넙치」를 비롯한 5편의 시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다.
가족이 모처럼 모인 외식 자리
넙치 한 마리 올라왔다
비대칭 눈을 뜬 채 반갑다고 파닥인다
젓가락으로 살점을 들어내니 흰 뼈만 남았다
눈앞에서 매운탕이 끓고 있는데
횟감 넙치가 눈을 감고
편안하게 몸에서 기름기를 뽑고 있다
한참을 우려내
개운한 맛으로 만찬을 즐겼다
허리춤에서 꼬깃꼬깃한 배춧잎 지폐가
손주들 웃음으로 싱싱한 횟집
모두들 일어서는데 노모가 납작하게 주저앉는다

가족은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다. 그렇지만 전근대사회의 농촌공동체와 같이 함께 노동한 후 맞이하는 밥상이 아니다. ‘모처럼의 외식’으로 모여 넙치 한 마리를 나눠 먹는 자리다. ‘비대칭 눈을 뜬’ 넙치를 회로 뜨고, 매운탕도 끓인다. 넙치의 살점을 들어내니 흰 뼈만 남고, 기름기 가득한 넙치 매운탕을 한참 우려낸다. 넙치의 개운한 맛으로 만찬을 즐겼다. 그때 늙은 어머니는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지폐를 꺼내 손주들에게 건네준다. 손주들의 웃음은 싱싱한 횟집을 창조한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만찬이 끝나고, 모두 일어서려는 찰나 “노모가 납작하게 주저앉는다”. 넙치는 노모의 은유다. 넙치가 살점을 들어내며 흰 뼈만 앙상하게 남고, 온몸의 기름기며, 뼈까지 우려내어 자식과 손주들까지 먹이는 상황은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준 노모를 연상하게 했던 것이다. 비대칭 눈을 뜨고 납작 엎드린 넙치와, 후손들이 모두 일어설 때 납작 주저앉는 노모를 포개어 놓은 것이다. 가족은 밥의 공동체이며, 그 밥이 부모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만찬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족 공동체 이어가기
시인에게 가족은 유교적 가족주의와 잇닿아 있다.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기꺼이 희생하고, 가족 공동체를 우선시한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식의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며 효를 행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격변의 시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부모가 내어준 살점과 뼈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의 가족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시인의 효심을 「넙치」는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어머니의 휠체어는 앞이 뒤에 있다
뒤에서 밀고 있는 내가
뒤로 간다고
고개를 돌려 염려해 주는 미소가 있어
나는 뒤로 가는 길이 안심된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미소가
뒤에 있는 나를 이끌고 있다
서로 웃다 보면 뒤가 참 좋다
휠체어 등에 난 더듬이가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세상의 그리움은 항상 뒤에 있다
뒷일을 부탁한다든가 뒤가 보인다는 말에는
등을 밀고 있는 뒤가 있어 든든하다는 말이다
손주들 이름을 줄줄이 기억해 내려는 것도
아직 머물고 있는 뒤가 따뜻해서일 것이다
문턱을 넘을 때도 나는 뒤로 넘는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미소는 화자를 이끌고, 화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어머니의 뒤에는 살아온 생의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다. 가족을 이끌던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등을 밀고 있는 뒤’, ‘아직 머물고 있는 뒤’인 후손들이 있어 든든하고, 따뜻해진다. 어머니의 웃음은 앞을 향하지 않고 ‘뒤’를 향해 있다. 어머니에게 앞으로 다가올 삶보다 뒤에 남겨진 삶, 자신의 연장이라 할 자식이 있어 따스함을 느낀다고 시인은 노래한다.
유교에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천륜의 공동체요, 시공간의 연속성을 지니는 소우주라고 인식된다. 부모-나-자녀의 수직적 계승 관계가 자애와 효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형제간에는 수평적 연대 의식을 지닌 채 우애와 공경을 중시한다. 가족을 기반으로 이웃과 국가, 천하로 이어진다. “하늘을 아버지로 부르며, 땅을 어머니라 부른다. 나는 작은 존재로 혼연히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이 우리 몸을 이루며, 천지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성(性)이다. 만민은 우리 동포며, 만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임금은 우리 부모의 종자(宗子)이며, 그 대신은 그 종자의 가상(家相)이다. 연세 많은 어른을 높이는 것은 (우리 집안의)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는 까닭이요, 외롭고 약한 이를 자애(慈愛)함은 어린이를 어린이로서 보살피는 것과 같다.…(중략)… 화(化)를 잘 살펴서 그 일을 잘 계승하고, 신(神)을 잘 궁구하면 그 뜻을 잘 계승할 수 있다.”[『성리대전(性理大全)』4, 「서명(西銘)」.]라고 성리학에서는 말한다. 「뒤로 가는 웃음」은 이와 같은 유교적 가계 계승의 논리에 부합하는 자애와 효도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물론 시인은 시 창작 과정에서 그러한 성리학적 가계 계승의 논리를 구현하려는 의도를 지녔던 것일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겠으나 시인은 전통적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을 것이다. 부자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가족의 생활이 변화하고, 여권이 신장되었으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주의의 확산이나 가족 성원 간 유대 약화 등 전통사회의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용수 「서구적 근대화와 한국 가족공동체의 변화」, 『평화학논총』7, 2017.] 시인은 그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그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리라.
어쩌면 그의 시는 고통 속에 일그러진 현실 앞에서 요순시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격양가(擊壤歌)」를 떠오르게 한다.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고 / 우물 파 물 마시고 / 밭 갈아 내 먹으니 /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干我何有哉”] 오영석 시인의 평범한 듯 보이는 가족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것은 현대의 가족 공동체의 해체 현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화장하고
유골함을 받은 내게
어머니 한 말씀 하신다
니 아버지 금니는 있더냐?
시어머니의 반지를 녹여 개금불사한
금니는 찾아와야 할 텐디
다시 반지나 만들어야 쓰것다
속 불로 육신은 다 태워도
수습할 무엇 하나가
남겨진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
아따, 어메도!
글안혀도 내도 금니 해얄 것 같아 챙겨 왔구먼요
「금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화장한 후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어머니가 화장한 아버지의 금니를 찾는다. 금니는 시어머니 반지를 녹여 만든, 아버지의 치아를 대신하던 것이다. 그것이 화장 잔류물[1천 도가 넘는 화장을 하면, 금니와 같은 인체 보철물이 남는다고 한다. 유족들이 수령을 않을 경우 공매 등으로 판매한 다음 시 수입에 편입한다.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준다고 한다.]로 남았을 것임을 어머니는 짐작했던 모양이다. 화자는 아버지의 금니를,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할 때 행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 의식을 한 것이라 표현한다. 어머니는 남편의 금니로 반지를 다시 만들 계획이라 하고, 화자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금니로 만들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금니는 “속 불로 육신은 다 태워도 / 수습할 무엇 하나가/ 남겨진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의미로 읽힌다. 할머니의 반지에서 아버지의 금니로 변화하더니, 이제는 어머니의 반지나 화자의 금니로 변할 것임을 말한다. 육신을 태워도 타지 않고 남은 금니는 남겨진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노래한다.
3. 가족의 확대인 이웃과 자연
늦은 밤 옆집이 벽에 못질한다
망치로 못의 머리를
한 번에 내리치지 않고
딱, 따닥... 딱, 따닥...
못을 잡은 왼손도 그 장단에 맞춰
못의 중심을 조금씩 낮춰간다
딱, 따닥...
무슨 신호 같다
벽에 못을 박는데도
그 아픔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며
벽이 놀라지 않게
날카로운 못 끝이 심장을 피해
조금씩 틈을 내자
벽도 못이 평생 짊어질 짐을 아는 듯
제 자리를 조금씩 내주면서
강하게 딱! 한번
아기 엉덩이에 주사 놓듯
한 템포 느리게 쓰다듬는, 따닥!
괜찮다고
이보다 더 큰 아픔도 잘 이겨내야지
딱, 따닥... 딱, 따닥...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딱, 소리보다는 따닥,에 마음이 열린다
못을 벽에 박는 게 아니라
어미가 젖을 먹이며
아기 등을 한 번씩 두드려 주는 듯한, 따닥
세밑 초저녁 메밀묵 장수가
메미~일, 하고 한 박자 쉬고
구수하게 묵!을 치는 여백 같다
늦은 밤 옆집의 못 박는 배경으로
벽이 담장처럼 허물어지면서
아파트가 한 평씩 넓어져 간다
딱, 따닥... 딱, 따닥...
시적 사유를 통해 사물도 생명을 부여받는다. 못질을 하는 소리로 시인은 상상한다. ‘따닥’ 하고 못을 박는 행위가 못이 박히는 벽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신호라고 상상한다. “벽이 놀라지 않게 / 날카로운 못 끝이 심장을 피해 / 조금씩 틈을 내”는 행위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못을 박는 행위는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등을 두드려 주는 것 같고, 세밑 메밀묵 장수가 “메미~일, 하고 한 박자 쉬고 / 구수하게 묵!을 치는 여백 같다”라고도 한다. 늦은 밤 옆집의 못 박는 소리는 벽이 담장처럼 허물어지며 아파트가 한 평씩 넓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유의 깊이를 넓혀가는 시인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못질의 넓이」는 이웃 간의 벽이 무너지는 상황을 상상하는 작품이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확장을 보여주는 상상력이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말하는 다음과 같은 유학의 도(道)를 떠올리게 한다.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처음부터 죽어서 관을 덮는 날까지 함께 지내는 존재는 사람일 뿐이다. 가까운 자를 부모 형제라 하고, 먼 자를 친구와 이웃이라고 하고, 낮은 자를 신하와 하인 어린이라고 하고, 높은 자를 군사와 노인이라 한다. 무릇 나와 더불어 머리를 같이 둥글게 하고 모난 발을 하고 하늘을 이고 땅을 딛는 자는 모두 나와 더불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접촉하며 서로 바로 잡아주며 생활하는 존재이다. 나도 한 사람, 그도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교제(交際)가 생긴다. …(중략)…우리의 도(道)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단지 교제에서 선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Ⅱ-13, 43, 「論語古今註」, “夫人生斯世 自落地之初 以至蓋棺之日 其所與處者人而已 其近者曰 父子兄弟 其遠者曰 朋友鄉人 其卑者曰 臣僕幼穉 其尊者曰 軍師耆老 凡與我同圓顱而方趾 戴天而履地者 皆與我相須相資相交相接 胥匡以生者也 我一人 彼一人 兩人之間 則生交際. …(中略)… 吾道 何爲者也 不過爲善於其際耳.”]
태어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함께 지내는 존재인 사람들. 가족에서 이웃으로, 나아가 국가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사람 사이의 교제, 사귐으로써 가족 공동체는 확대된다. 그런데 그 공동체 확대에서 중요한 도(道)는 선(善)이라고 한다. 선은 유가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도덕인 인(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못질의 넓이」가 포착하는 세계가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어짊, 곧 사랑이다. 그 사랑은 가족 공동체의 확대요,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이다. 늦은 밤에 못질을 하는 행위가 거슬릴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벽을 허무는 신호처럼 듣는 시인의 상상력은 앞서 본 가족주의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시골 관사 모퉁이에
한 평 남짓
묵정밭을 일구었다
오이와 토마토를 심고
배추에게도 한자리 내주었다
거미가 한나절 만에 집 한 채 짓고 애벌레는 배춧잎을 갉아 먹고 지렁이는 밤의 깊이를 지이이루 늘이거나 줄여갔으며 무당벌레는 꽃대궁 끝까지 올라가 비행하였고 오이꽃에 가슴 앓던 나비는 뒷걸음을 쳤다
내 것인 줄 알았던 텃밭에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한 평 남짓 텃밭에 대하여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도
그렇다고 혼자 소유하지도 않는다
시인은 시골 관사 모퉁이에 한 평 남짓한 묵정밭을 일구었다. 오래 버려두어 거칠어진 밭인 묵정밭에 오이, 토마토, 배추도 심었다. 채소를 거둘 생각으로 일군 그곳에는 온갖 생명들이 사는 터전이 되었다. 거미, 애벌레, 지렁이, 무당벌레, 나비 등 모두가 주인인 텃밭,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화자는 말한다. “어느 누구도 / 한 평 남짓 텃밭에 대하여 /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도 / 그렇다고 혼자 소유하지도 않는다”라고. 「텃밭의 주인」은 가족 공동체의 확대 지점이 어디에 가 닿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무릇 인(仁)이란 단지 사랑의 이치로서 사람은 모두 그것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혹 공평무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바에 도리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직 공평무사하면 천지 만물을 모두 일체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바가 없다. 사랑의 이치란 자연히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지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긴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주자대전(朱子大全)』 32, 「答張敬夫·仁說」, “蓋仁只是愛之理 人皆有之 然人或不公 則於其所當愛者 反有所不愛 惟公 則是天地萬物 皆錢一體 無所不愛矣 若愛之理 則是自然本有之理 不必爲天下萬物同體而後有也”]
어짊이 본래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 본성으로 인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라 여긴다고 했다. 오영석 시인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웃, 그리고 작은 벌레에까지 미치는 시적 형상화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연장선과 맥을 같이한다.
오영석 시인의 다섯 작품은 가족에 대한 사랑, 존재 방식, 그리고 그것의 확대로서의 이웃 사랑, 천하 만물에 대한 사랑까지 보여주고 있다. 화장한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뒤를 보는 어머니, 그들이 함께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며 이어져 간다.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의 애잔함이 감정을 절제하는 시적 표현을 통해 풍경 소리처럼 들려온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 너머에 이웃과 천하 만물에 대한 사랑까지 이어져 진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