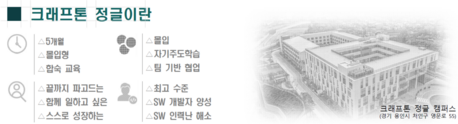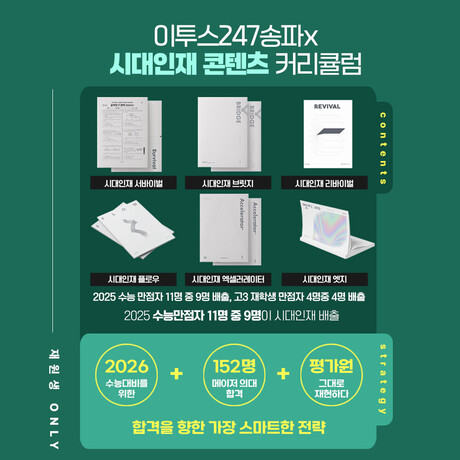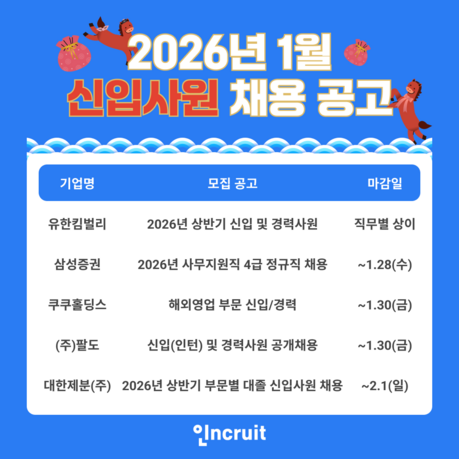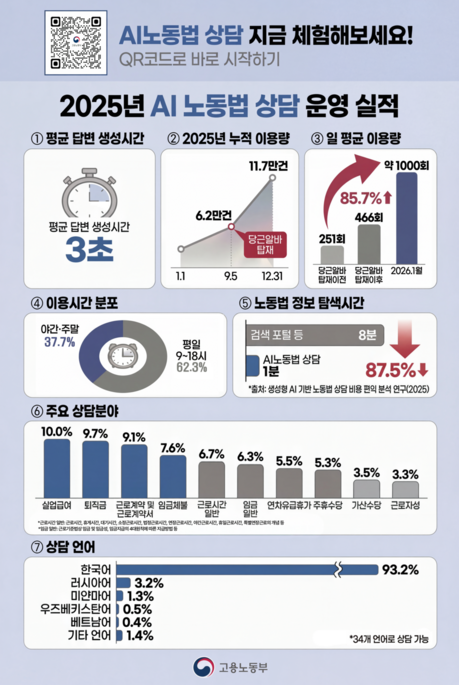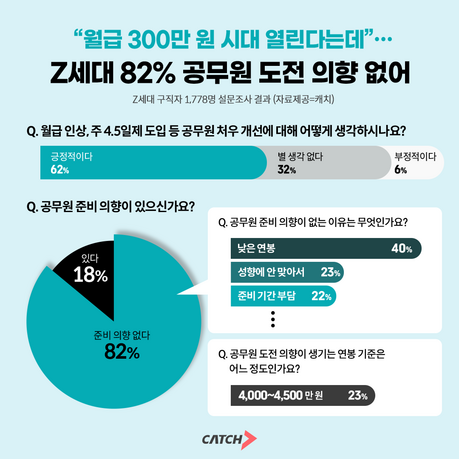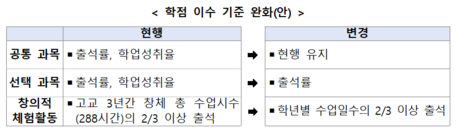산돼지를 닮은 사내
 |
| ▲ 김문호 |
대한해운공사의 동남아영업부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다부진 체구에 뭉툭한 인상의 사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영업과장이여?”
내 책상 위의 명판을 보면서도 시비조의 어투가 생김새처럼 뭉툭했습니다. 나 또한 그의 격조에 맞출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소만,”
“나 이 회사의 수출과장인데 우리 짐 좀 실어줘. 방산물자여.”
“소총이나 대포, 탱크라면 몰라도 실탄이나 폭발물은 안 되지.”
“뭐여, 무역선 회사라면서 수출품을 못 싣는다고? 나는 싣고 말 거야”
그렇게 시작된 그의 저돌적 파상공세였습니다. 국제운송법규가 그렇다는 설명에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딴 것은 해운회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훈계까지 곁들이면서 말이지요. 그런 그가 조금 귀찮긴 해도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모르고 날뛰는 그의 천방지축을 주물러보려는 호기심 아니면 객기의 발로였던지요.
제풀에 주저앉은 줄 알았던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해가 바뀐 벽두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의 차장 진급을 축하한다면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때는 다투면서도 술자리는 지속했거든요. 해운이나 수출입회사의 영업 간부들에겐 그곳이 바로 업무 현장이었지요. 웬만한 거래는 안면과 인정으로 이뤄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지정한 주점을 들어섰더니 그와 그의 직장동료 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로서 이번에 함께 진급한, 일반 제품부서의 차장이라는 소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시에 차장으로 진급한 셋 동감내기의 자축연이 된 셈이었지요.
그가 친구를 종용하더군요. 그쪽의 수출품 선적을 내게 몰아주라면서. 그러고는 내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공격할 것이니 서로 이해하자고. 놀랍게도 술자리의 그는 호주(豪酒)에 신사였고 나로서는 고개를 끄덕일 밖에요.
그런 얼마 후에 회장실의 호출이었습니다. 회장은 내게 그들 회사의 짐을 실어줄 수 없겠느냐고 묻더군요. 일전에 그가 말하던 역량인가 뭔가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양쪽 회사의 회장들은 고위층을 사이에 둔 인척관계였거든요. 규정상 불가하다면서 설명하려하자, 회장이 손을 젓더군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다면서 말입니다.
회장의 그런 처사야말로 내 직장생활의 근거였습니다. 외항선 선장에서 본사 발령 받으면서, 육상에서도 항해사로 살리라 다짐했거든요. 소신껏 일하되 내 양심과 자율의 울타리는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그런 얼마 후에 사무실로 찾아온 그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직장생활은 그 따위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해양대학을 나와서 서울에는 별 백도 없는 나를 반드시 거꾸러뜨릴 거라고. 그러면서 내 호기심 내지 객기를 적개심 쪽으로 몰았습니다.
다음 공세는 관권 동원이었습니다. 내 대학선배라는, 해운관청 국장의 전화였지요.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유였습니다. 산돼지 같은 그가 그곳 관청에서 나를 성토하며 생떼를 쓰자, 소위 학연을 찾아 연결된 전화였겠지요.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기차에 실린 50톤이 폭발하면서 호남의 도시 하나를 날려 보냈던 그것을 대량으로 싣고 국제해협들을 지나다니는 일이니 관할관청의 지시각서만 주십사고 말이지요.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말씀 드렸지요. “그래서 못 싣는 것입니다 선배님!”
한참 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방산담당 과장이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가서 그를 설득시키라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로서는 벋댈 수밖에요. 간첩도 아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 그가 올라온다면 알아듣게 설명은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들의 무소불위 위세가 무섭던 시절이었지요.
그가 식식거리며 사무실을 나섰을 때도 꺼림칙했습니다. 휑한 사무실이 지하 주차장과 다를 바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는 내 사무실을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는 나를 공격할 수단이 없었던 지요. 그래도 그 회사의 일반제품 선적이 늘어나면서 셋의 술자리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회사를 사직하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곧 본격적인 물량이 쏟아지는데 수출할 길이 없으니 책임자로서 어쩌겠느냐면서. 길이야 왜 없겠느냐는 나의 지적에 그가 안색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자신을 박대했던 이유가 뭐냐고. 내가 받았지요. “당신이 너무 무례했거든”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되겠느냐는 그를 말렸습니다. 서로 미숙했던 지난날은 잊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와 내가 현재의 직분에 있는 한, 예의 동남아 수출품 선적은 전적으로 내게 넘긴다는 약속이면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가 자기회사 사장의 각서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내가 거절했지요. 젊은 사내들의 언약으로 족하다면서.
그와 내가 손을 맞잡자, 그의 동기생 친구가 증인을 자처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그와 함께 내 급선무는 회사의 동남아정기선 2척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물이 실릴 선창에 화재 탐지기와 자동 사워시설을 갖추는 일이었지요. 그러고는 두꺼운 송판으로 탄약고(magazine)를 짜서 다른 화물들과 격리시키는 선적 요령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었고, 유엔 산하 정부 간 해사협의기구(IMCO) 발행의 위험물 운송법규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그때 내 사무실 책장에 먼지를 쓴 채 꽂혀있던 그 책자는 아마도 국내 유일의 것이며 그것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도 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선임자들이 스쳐봤더라도, 실무에 소용이 되지도 않는 깨알 영문 조항들을 돋보기로 살폈을 리는 없으리니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의 빈국이던 우리나라의 방산제품 수출이란 상상조차 어려운 때였으니까요. 회사의 공무부서에 설치를 의뢰했더니 척당 5만여 불이 든다면서 난색이었습니다. 하긴 지난 70년대의 그만한 외화가 가벼운 액수는 아니었지요.
국내 최초의 방산제품 수출이 본격화되자, 그간 손익분기점을 맴돌던 회사의 동남아 정기선 항로가 너끈한 수익노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들 방산품의 운임이 매 항차 3천여 톤씩 싣던 포항제철 압연강판의 그것에 맞먹을 정도였거든요. 톤수나 하역비용은 비교도 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소위 고율운임 화물(high paying cargo)이었지요. 거기에 화약회사와 종합상사들이 편승하면서 항로의 채산은 더욱 튼실해졌지요.
경쟁 선박회사들이 방관할 리 없었지요. 온갖 수단과 인맥을 동원하면서 그의 회사를 두드렸겠지요. 몇몇 화주들과 함께 관청을 찾아가서 독식과 높은 운임을 성토하면서 나를 불러들이게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나의 아성을 비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관청의 소관부처에서 내게 묻더군요. 법제화되지 못한 실무의 진행을 어쩌면 좋겠느냐고.
내가 영국 계 해사검정회사의 대학선배 사장을 추천했지요. 그런 한참 후에 사륙배판의 두툼한 책 한 권이 저자의 증정본으로 배달돼 왔습니다. 한국위험물운송법규.
그와 나의 아성에서 내가 먼저 발을 뽑았습니다. 축성 2년여 후에 부장으로 진급해서 6년을 더 지낸 다음이었지요. 그와 내가 부딪친 지 아홉 해가 되는 때였습니다.
여념 없이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라고 했습니다. 점령군처럼 거들먹이는 은행의 관리요원들 대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육상근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시점인가 싶었지요. 털고 나설 수밖에요.
그로부터 서른일곱 해, 밭뙈기 농사로 골몰한 내가 가끔 상경 길에 그를 찾습니다. 그룹출신 임원들의 친목회를 맡고 있는 그의 강남 사무실 옆 찻집으로 말입니다. 왕릉의 수림이 건너다보이는 식당 창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장수막걸리 두 병, 혹은 한 병을 더 시켜서 조금 남기기도 하면서.
백두대간을 산돼지처럼 닫던 그가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나를 배웅합니다. “건강해야 여” 근래에 두드러지는 충청도 억양입니다. 그러면서 싱긋 웃는 그의 안면이 푸근합니다. 한때 나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던 바로 그 웃음입니다. 웃음도 세월 따라 숙성이 되는지요. 아니면 내 노안의 시력이 무딘 만큼 너그러워진 것인지요?
그때 으르렁거리면서도 외면하지 않았던 회상이 지금에 새롭습니다. 30대 초반 혈기의 서로치기였을 뿐, 언젠가는 손을 맞잡게 되리라는 사리의 공감 같은 것이었던 지요. 사실 그때 그들의 초기 제품은 비행기로나 실어 나를 견본품 수준이었지 선체를 개조하며 대비할 물량은 아니었고요.
렌, 어느새 강산의 봄입니다. 그런데도 마냥 덤덤합니다. “해마다 피는 꽃은 옛 모습 그대론데(年年花似同), 사람의 모습은 한 해가 다르다(歲歲人不同)”라는 옛 구절이 절실한 나이 탓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4월은 또 한 번 잔인한 달인지요.
꽃 한 번 피고 질 때마다 좁아드는 내 오솔길의 리라꽃 향내 같은 그대. 더도 말고 이냥 이대로만 내내 강령하소서.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