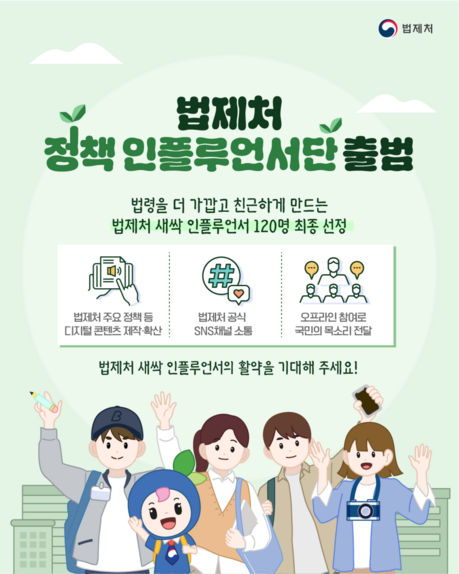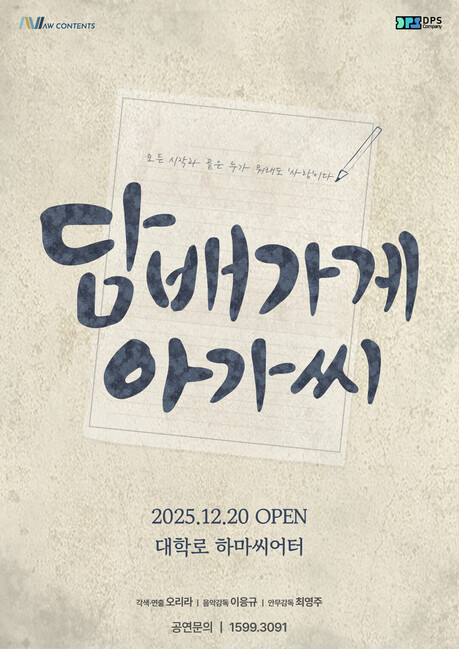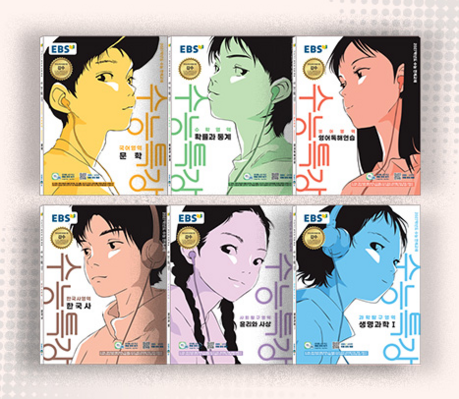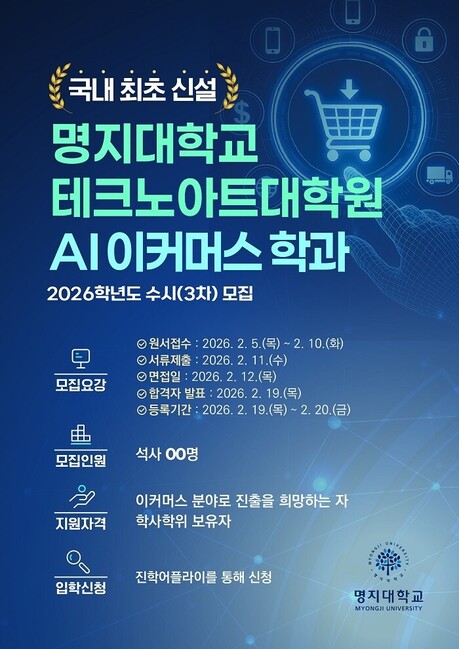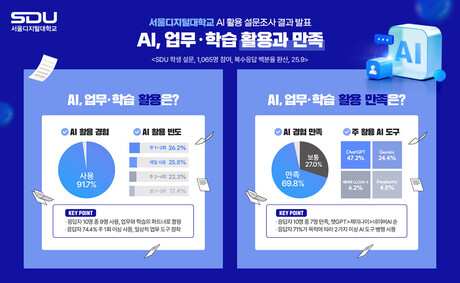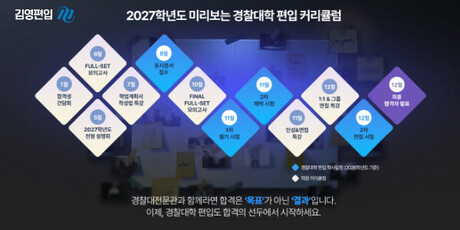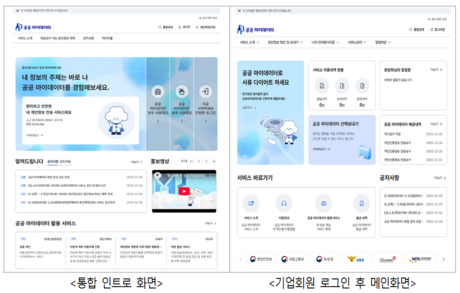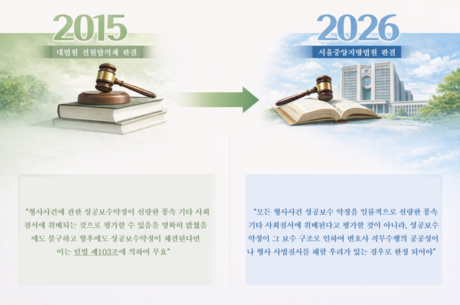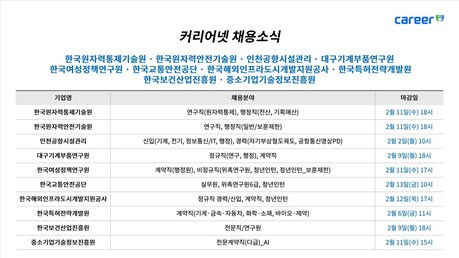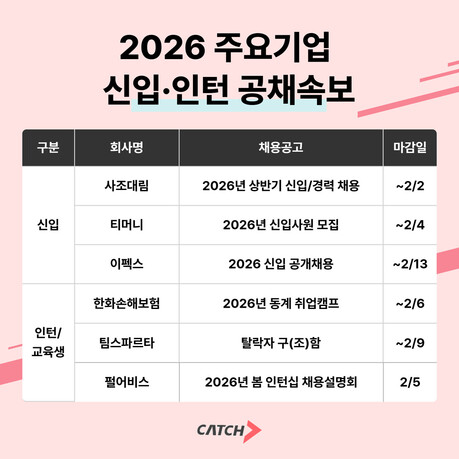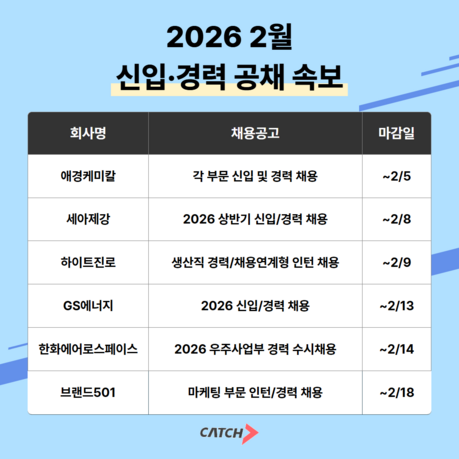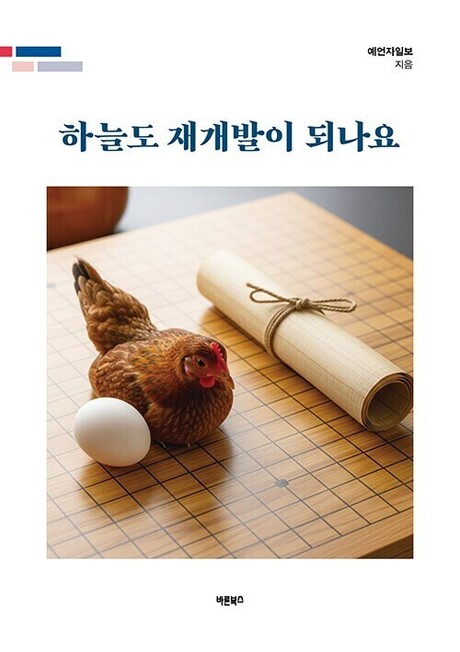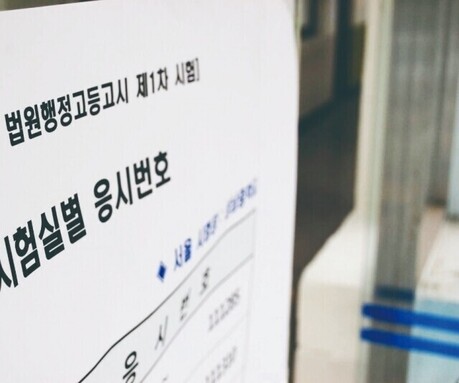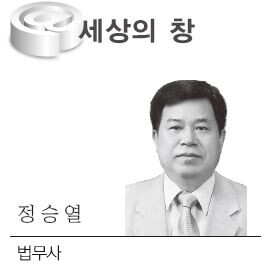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세력은 친북좌파 정부라며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비전을 지시하지 못한 채 격화되는 정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의 골만 깊게 하여 나라는 큰 혼란 속에 빠졌다. 이 와중에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청와대 일부 참모와 두 명의 법무부장관 가족의 잇단 스캔들은 야당은 물론 뜻있는 국민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프랑스어 노블레스(noblesse)는 능력 있는 사람들, 즉 귀족을 지칭하고, 오블리주(oblige)는 묶여있는 혹은 책임, 의무의 뜻이다. 이것은 로마 시대부터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 등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집정관(Consul)은 귀족계급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관직이었는데, 로마에서는 16년간의 2차 포에니 전쟁 중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귀족들은 전쟁 참전 이외에 사회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도 강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정(帝政) 이후에는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적 해이로 로마제국은 급속히 쇠퇴해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영국과 프랑스가 왕위계승권을 놓고 백년전쟁을 벌일 때, 영국에서 가까운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Calais) 시민들이 보여준 데서 확고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1347년 칼레가 11개월 동안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채 저항하다가 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칼레시민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하면서 자비를 구했다. 에드워드 3세는 장기간 저항한 시민과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꿔서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 그동안의 저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시의 대표 6명이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칼레시민들은 누가 처형당해야 할지를 논의했는데, 이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어서 시장·상인. 법률가 등 귀족들이 동참했다. 다음날 이들은 처형받기 위해서 목에 밧줄을 메고 맨발로 교수대로 걸어갔는데, 이것을 본 시민들은 적에게 항복했다는 굴욕감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고귀한 신분의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결속력을 느꼈다.
그런데, 이때 에드워드 3세의 임신한 왕비가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이들을 죽이지 말라는 간청하자.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모두 살려주었다. 그 후 1895년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희생을 자처한 6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섯 명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칼레시청 앞에 세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법적 규범이 아니라 도덕적·사회적 규범이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할 때, 소명의식으로 나타나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는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도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 6·25전쟁 때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 중 전사했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