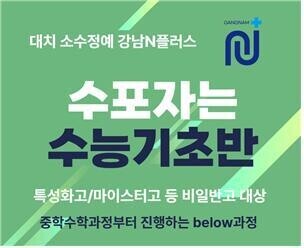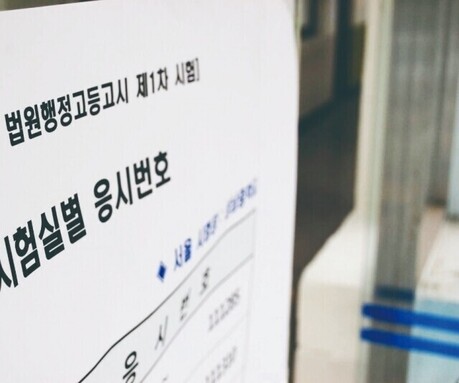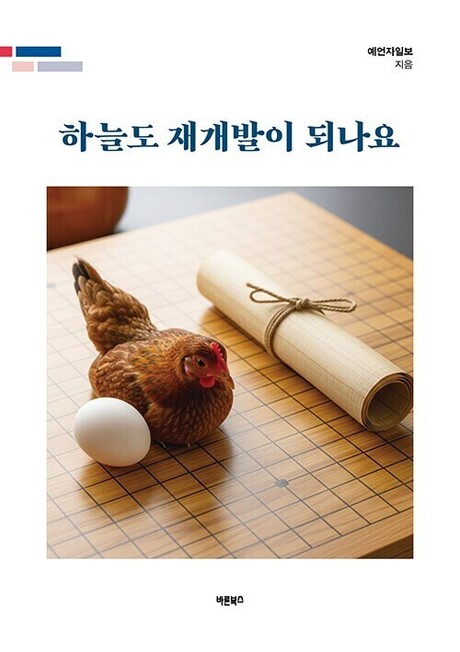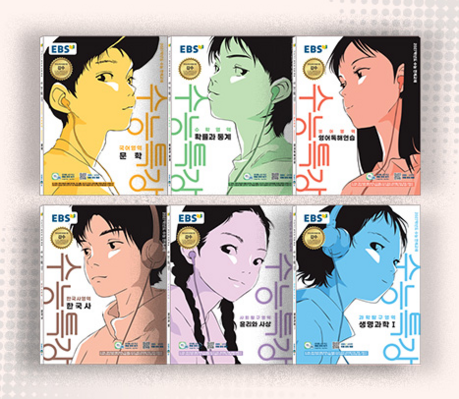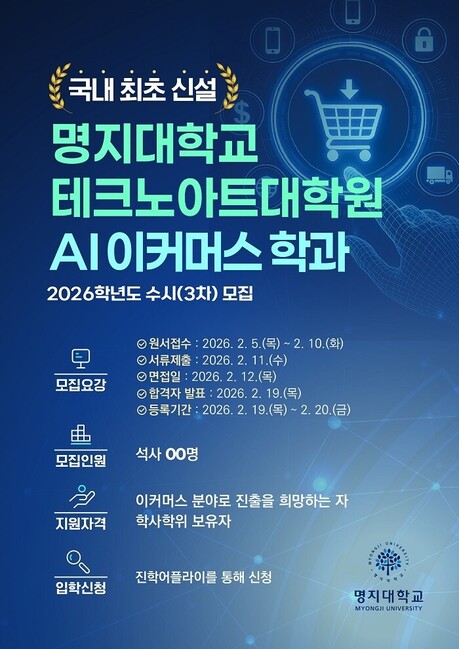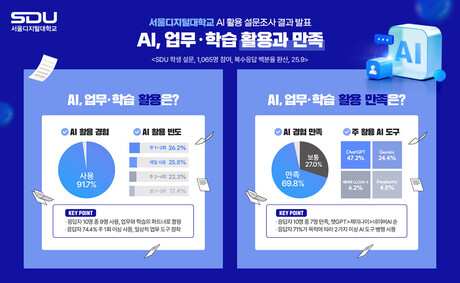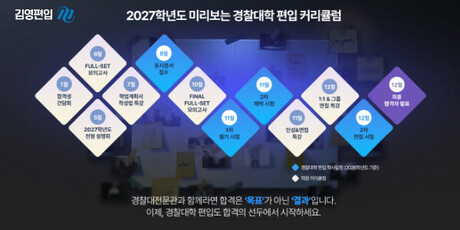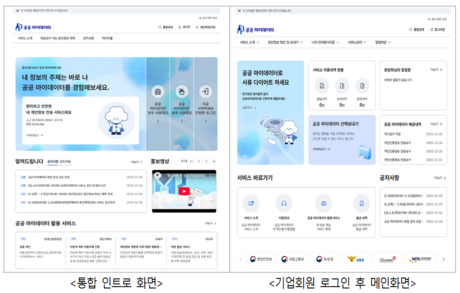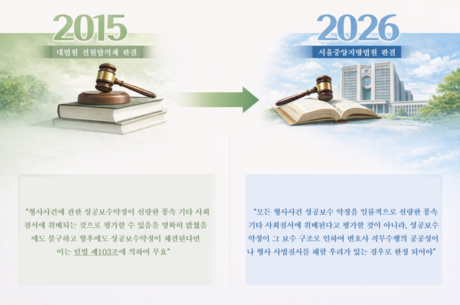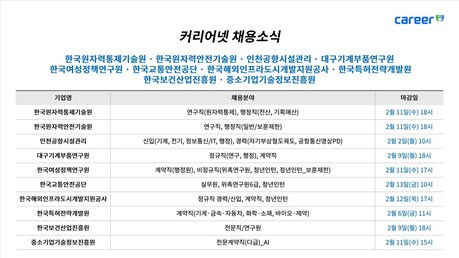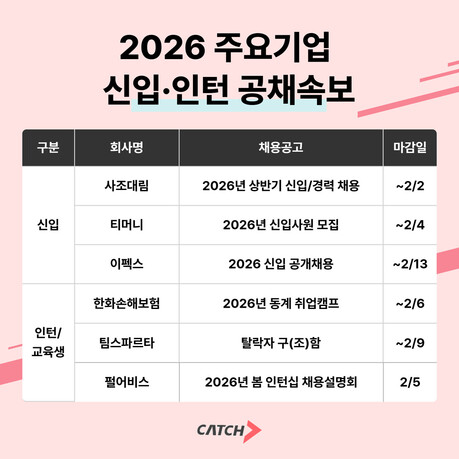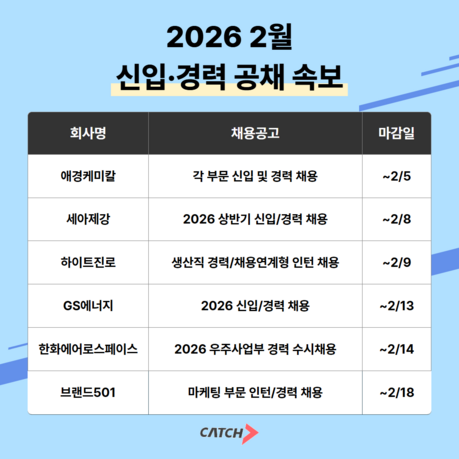※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제이던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2,093만)의 31.7%라고 했다. 2005년 이전까지는 4인 가구가 압도적이더니,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해서 세 집에 하나가 홀로 사는 셈이다. 살펴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주는 20대가 19.1%, 30대 16.8%, 65세 이상 고령자가 25%로서 166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그중 70대 이상도 18.1%라고 한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204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손(祖孫)이 함께 살던 대가족 사회에서는 부모의 부양이 한 가정의 문제에 그쳤으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핵가족제로 변한 198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었다. 우리는 10간 12 지(十干十二支)로 회갑(回甲)을 기준하여 회갑을 맞은 이들을 노인(老人)이라고 했는데, 본래 늙은 “노(老)”자는 원숙과 존경을 뜻하는 표의문자였다. 1981년 6월 제젙된 노인복지법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노인은 1960년 79만 명에서 1995년 266만 명, 2000년에는 337만, 2020년에는 690만에 이른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5년 5.9%, 2000년 7.1%, 그리고 2020년에는 13.2%가 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또, 피부양 지수(연소인구 및 노인인구)도 1980∼ 2000년 사이에는 연소인구 부양비가 82.5%에서 29.4%로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노인인구 부양비는 6.0%에서 9.4%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인구의 연소인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화지수(老年化指數)는 같은 기간 동안 7.2%에서 31.9%로 크게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99.8%가 되어서 연소인구와 그 수가 같아지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즉, 연소인구 1인이 자신 이외에 노인 1인을 부양하는 사회구조가 되는 셈이다.
오늘날 노인 문제는 ① 경제적 빈곤, ② 보건·의료문제, ③ 무위(無爲)·무료(無聊), ④ 사회적 소외 등 이른바 ‘노인의 사고(四苦)’라고 하는데, 미풍양속이라고 자랑하던 충효 사상이 사라져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형제끼리도 뿔뿔이 살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아노미(Anomie)가 만연되어 혼자 쓸쓸히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이제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다. 일찍이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이런 제도 마련과 함께 인간의 정서를 교감할 기회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만(David Riesman)의 ‘고독한 군중’처럼 인정이 교감하지 않는 무리 속에서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서 인간끼리 교감하지 못하고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며 교감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 점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우리는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이 넘고, 반려동물도 86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인간사회에서 인간들끼리 교감하지 못하고, 인간이 동물과 교감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사회의 격변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관계가 해체된 사회에서 노인이 사회로부터도 따돌림을 받는 소외(疎外)현상은 노인에 대한 거부, 천시·냉대, 무관심, 무례함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통과 개혁이 조화롭게 경로사상을 강화하고, 노인의 개인적 소외와 고독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들과 양부모나 의형제 혹은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소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고령자들은 한 세대 전 불모지 이땅에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룬 주역이기에 각종 사회부조와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의 신체적 노쇠와 질병에서 오는 대표적인 질환은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질병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이며, 많은 노인이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체계,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확충, 노인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등이 정책문제가 되고 있다.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애를 황구(黃口), 10대를 소년(少年), 20대를 청년(靑年), 30대를 장년(壯年, 40대를 초로(初老), 50대를 중로(中老), 60대를 기로(耆老)라고 했다. 또, 동년배를 적자(敵者), 10세 위 형님뻘을 장자(長者), 20세 위로서 아버지뻘을 존자(尊者), 10세 아래 동생뻘을 소자(小者), 20세 아래 아들뻘을 유자(幼者)라고 불렀다. 또, 예기(禮記)에서는 30세를 장년(壯年), 40대를 강사(强仕), 50세를 머리가 쑥처럼 변한다고 하여 애년(艾年), 60세를 자리에 앉아서 이것 해라 저것 하라 하며 손가락만 놀린다고 해서 지사(指使) 혹은 기(耆), 70세를 노(老), 80∼90세를 모(耄)라고 했는데, 공자는 살아온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정신연령에 따른 합당한 호칭을 지었다. 40세를 흔들리지 않고 주관이 선다고 해서 불혹(不惑), 쉰이 되어야 천명을 알게 된다고 해서 지천명(知天命), 예순을 이순(耳順), 일흔을 언행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여 종심(從心)이라고 했다. 여기에 70세(七旬)를 아주 보기 드물다 하여 고희(古稀), 여든 살은 팔순(八旬), 아흔아홉 살은 백수(白壽)라고 했다. 특히 백수란 ‘百’에서 ‘一’을 빼면 99가 된다는 데서 ‘白’ 자가 유래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도 아닌 나 혼자만의 1인 가구가 팽창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는 이른바 고려장(高麗葬)이 현대사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