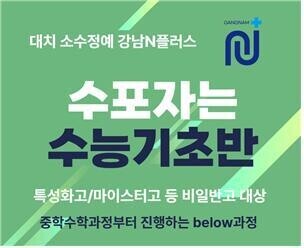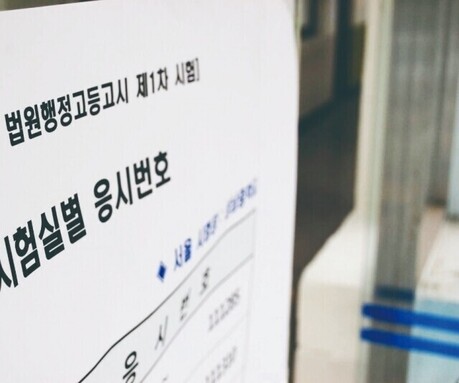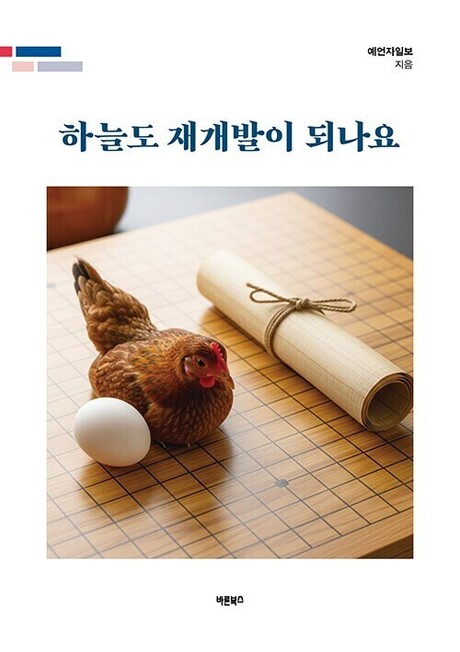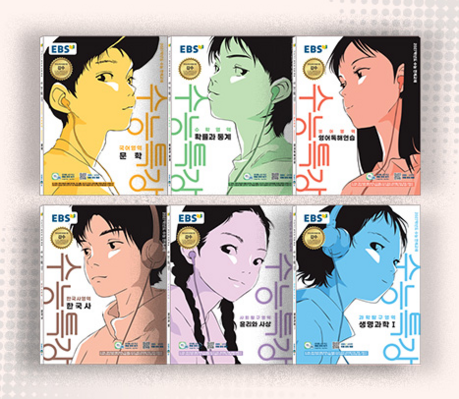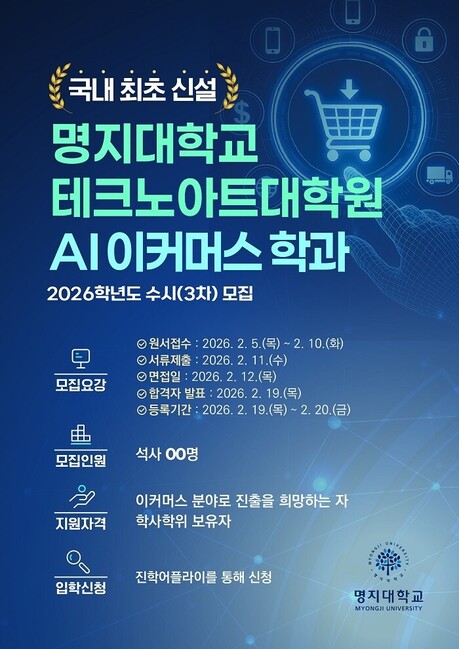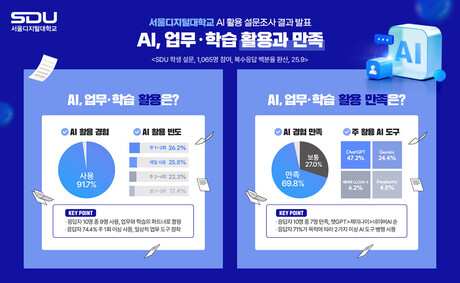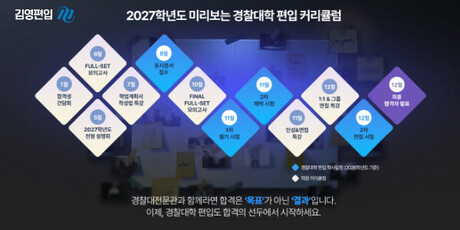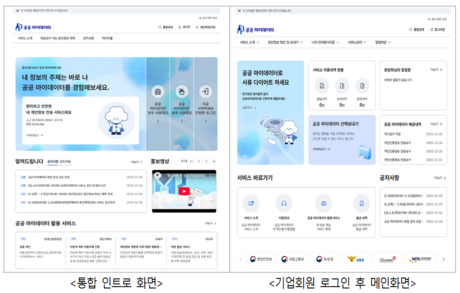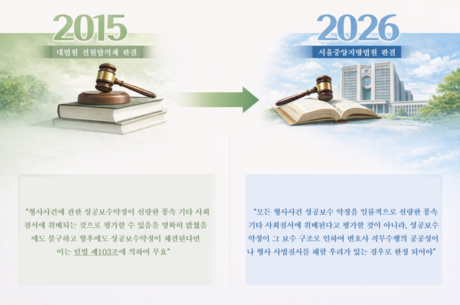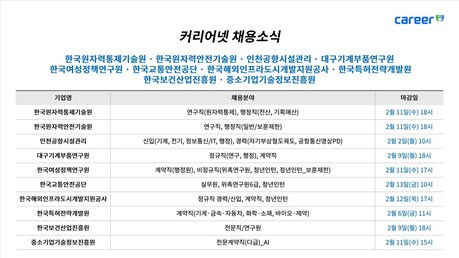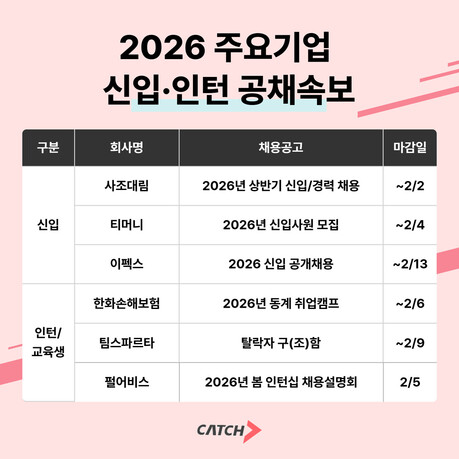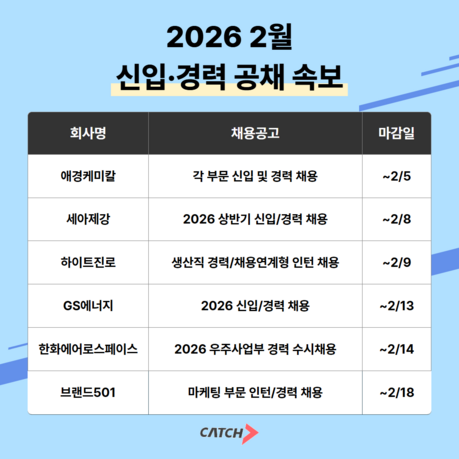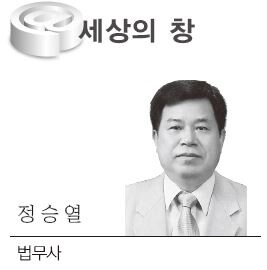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난 7월 1일, 한 달 전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지자체의 장과 의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이 취임했다. 고작 몇만 명에 그친 도시국가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 시민들의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자치가 19세기 들어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미화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회의원에 의해 조종당하는 정당의 하수인(?) 같다고 생각된다. 주민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과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여 마을마다 정당의 영향으로 갈등으로 선거 때마다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까마귀고기를 먹은 것처럼 모두 잊어버리고 만다. 지금은 잊고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위성정당을 공공연히 인정하여 비례대표에 의한 국회의원이 출현하게 된 국회의원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당정치의 폐해가 오죽했으면, 19세기 내내 미국에서 정당(Party)을 패거리 또는 붕당이라 하여 적대시했을까?
올여름에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로마제국쇠망사’를 읽으면서 넘기기로 했다. 2~3년 전 ‘사기 열전’과 ‘십팔 사략’ 등 중국 사서를 정독하면서 무더위를 잊은 것과 비슷하다. 평소에는 업무에 쫓겨 두꺼운 책을 읽지 못하다가 휴가철을 이용해서 집중적인 독서로 빈약한 머릿속을 재충전하며,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옛날이라 해도 코미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창녀가 여왕이 되었다’는 것은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에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첨단기술로 세운 소피아성당을 비롯하여 세르기우스와 성, 바쿠스 교회 등을 짓고, 로마법대전을 비롯하여 많은 법전을 펴내면서 로마제국의 부활을 꿈꾸던 위대한 황제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Justinianus Ⅰ: 482?∼565)와 그 왕비가 주인공이다. 흔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인간의 행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것에 놀랍다.
콘스탄티노플의 근위군 사령관이던 숙부 유스티누스 1세의 양자가 되었다가 그의 사후 동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18년 동안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콘스탄티노플 경기장에서 맹수들을 키우던 동물사육사 아카카우스의 딸 테오도라(Theodora: 500?∼548)의 미모에 빠져 그녀를 귀족으로 신분을 승격시켰다가 다시 정식 아내로 삼았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키프로스 섬 출신인 테오도라는 극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뭇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타고난 미모에 반한 젊은 부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당시 귀족은 하층민이나 광대 출신 등 천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을 고쳐서 결혼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고, 밤이 되면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던 그녀에게 이제 왕비로 모셔야 했을 당시 궁중의 법도와 혼란스러웠을 사회윤리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로마제국을 분할통치하는 공동 황제로까지 임명하였으니, 테오도라의 미모는 가히 경국지색이었던 것 같다. 데오도라 여황제는 재위 24년 만인 48세 때 암으로 죽었는데, 공동 황제로서 그녀의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다.
아드리아해에 인접한 작은 도시 라벤나의 산비탈레성당(Chiesadi San Vitale)에 그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서로마제국 멸망 후, 6세기부터 8세기까지 동로마제국이 이탈리아 통치 때 총독이 머물던 도시 라벤나의 산비탈레성당은 이탈리아 특유의 간소한 벽돌로 쌓은 벽과 돔(dome) 양식의 팔각당에 모자이크 벽화로 내부를 장식한, 당시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비잔틴 양식이다. 제실(祭室)에는 ‘영광의 그리스도’상이 있고, 그 좌우 아래쪽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 황제를 그린 2개의 패널이 있다. 그리고 ‘구약성서’를 이야기로 그린 그림과 천장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페르시아 카펫과 같은 식물무늬 등 금색·빨간색·녹색·파란색 등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여 화려하다.
물론, 세상을 지배한 왕들이 하찮은 여자의 치맛자락에 놀아난 사례는 동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서시(西施) 이야기도 그렇다. 춘추시대 말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에게 패한 월나라 왕 구천(勾踐)은 부차가 호색가라는 사실을 알고, 미인계로 복수하려고 범려를 시켜서 나무꾼의 딸이던 서시를 데려와 여러 가지 기예를 가르쳐 오나라에 보냈다. 결국, 부차는 오자서 등 충신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서시를 사랑하다가 마침내 오나라 멸망의 요인이 되었다. 서시의 이름은 미녀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후세 시인들의 시에도 자주 등장한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경국지색(傾國之色)이라고……. -로마제국쇠망사를 읽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