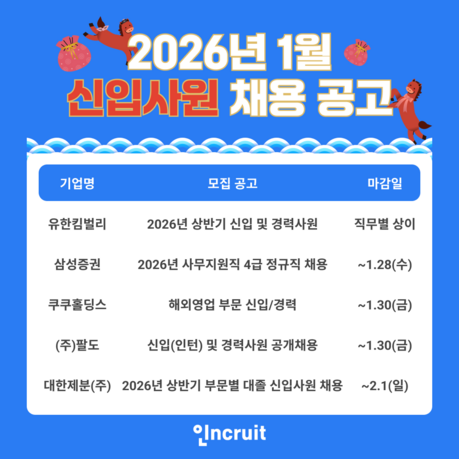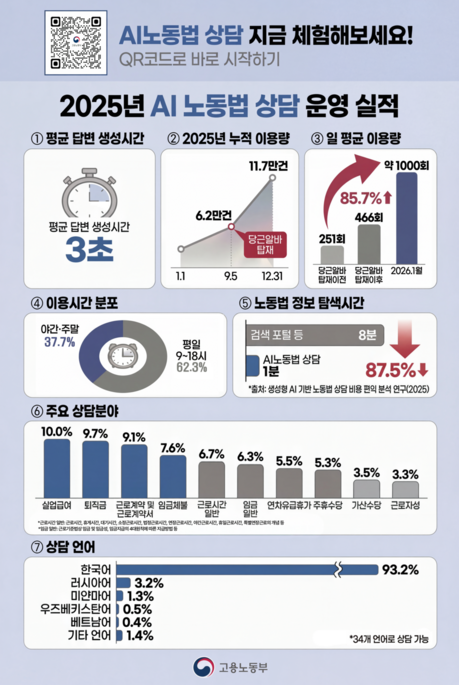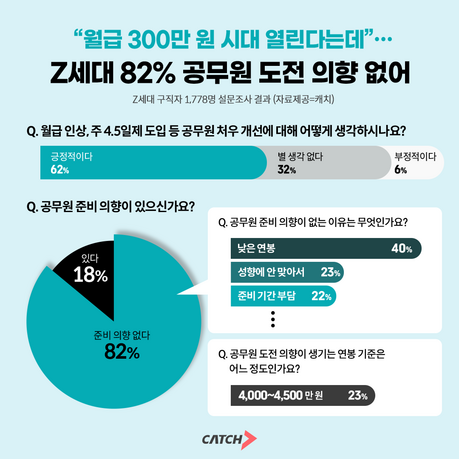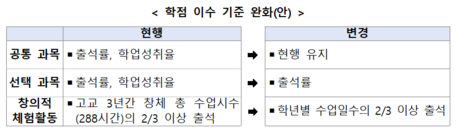어느 해 가을
 |
| ▲ 이현실 |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은 인공 연못 위에 유화 한 폭을 그려놓았다. 보름달을 가로지르는 기러기 떼에서 먼 그리움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온다. 산다는 것은 그리움을 쌓는 것이다. 홀로 떨어지는 잎새도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다. 가을 낙엽처럼 인생도 과거와 추억이 쌓여 고즈넉한 현재가 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의 순환 앞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스스로를 뒤돌아본다. 부끄럽다.
오돌토돌 점자처럼 박힌 보도블록 위를 걸어간다. 가로수 변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양옆으로 도열하듯 서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단풍잎들이 나풀나풀 떨어져 내린다. 나뭇잎 하나를 주워든다. 부챗살 같은 이파리를 팽그르르 돌려본다.
가을이 되면 못내 생각나는 이름 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살짝 주근깨가 얹혀있던 친구. 다박머리가 어깨 위에 찰랑거리던 중학생 시절, 문예반에서 함께 활동하던 단짝 친구 추자秋子다.
어느 해의 늦가을 오후, 하얀 새러 복에 주름 잡힌 교복 치마를 입고 교문을 향해 걷고 있었을 때였다.
잘 말린 한 무더기 건초를 태우는 것 같은 구수한 냄새가 바람에 솔솔 묻혀왔다. 늦은 저녁 무렵 시골 길 둑을 걸어갈 때 두엄 냄새에 묻혀 피어오르던 정겨운 그 냄새…. 추자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두 눈이 마주쳤고 책가방을 덜렁거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키 큰 플라타너스 나무 밑으로 후다닥 뛰어갔다.
그날 우린 국어 시간에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란 수필을 공부했고 거의 여러 단락의 문장을 줄줄 외우다시피 심취해 있었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낸 커피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 어느 때까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한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심오한 철학적 사고를 주는 문장이다.
떠꺼머리 노총각이었던 호랑이 체육 선생님이 쇠스랑으로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빛바랜 플라타너스 잎들이 동그랗게 회오리를 일으키며 운동장을 이리저리 쏠려 다녔다.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린 교복 치마에 수북이 낙엽을 끌어 담았다. 가는 연기가 푸석푸석 새 나오는 가랑잎 위에 하르르 쏟아 부었다. 불꽃이 사그라질듯하면 작은 나뭇가지를 쑤석거려 후우!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불꽃은 금세 화들짝 놀라는 아이처럼 타닥타닥 맹렬히 타올랐다.
또 한 차례 바람이 불자 은행잎들이 후드득쏟아진다. 십일월의 금빛 노을 속에서 부서져 내리는 조락凋落의 아름다움. 떨어지는 것의 슬픔이 이처럼 찬란할 수가 있을까?
지난 시간들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떼어 내도 떼어 내도 자꾸만 분열하는 아메바처럼 언제나 실패하고 미완인 내 모습이 싫어서 왜 나만 이래야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던 시간이 있었다.
은행나무는 내게 조곤조곤 말한다.
뇌성벽력 치던 한 여름 밤 폭우 속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잔뿌리를 거머쥐던 완강함을.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고 한낮의 뙤약볕에 하아! 하아! 뜨거운 숨 몰아쉬며 수액을 감아올리던 많은 날의 인내를. 진눈깨비 몰아치던 혹한에도 새봄을 노래하던 뿌리 깊은 나무의 시간들을! 生으로 그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지 않고 순리에 몸을 맡기며 묵묵히 견뎌온 은행나무의 한 생을 보라! 인간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순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지 않은가.
가슴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욕망의 등짐을 잠시 은행나무 밑에 부려놓는다. 약동하는 푸른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이제 스스로 거름이 되어갈 은행나무의 소멸하는 조용한 슬픔을 바라보고 있다. 비우고 거둬낸 자에게서만 느끼는 건강한 향기다.
가을이 부려놓은 낙엽 소리를 듣는다. 겸손한 자세로 물든 낙엽을 바라보면서 삶의 소박한 진리를 알아낸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본다. 오늘의 내 모습도 세심히 살펴보게 되며 다른 이의 삶에 대한 관심도 생겨지지 않을까.
누구나 가슴에 지니고 사는 그리움, 산다는 것은 그리움을 쌓는 일이 아닐까. 낙엽 태우는 냄새 속에 묻어나는 잊을 수 없는 이름 추자秋子와 함께 가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긴 내 그림자도 따라나선다.
이현실 작가
한국예총「예술세계」수필 등단(2003) 「미래시학」시 등단
시집「꽃지에 물들다」「소리계단」「챗-GPT에 시를 쓰지 않는 이유」
수필집 「그가 나를 불렀다」외 1권. 공저「3인의 칸타빌레」외 100여 권
현 계간「미래시학」주간. 도서출판「지성의 샘」주간
한국농촌문학상. 국가보훈콘텐츠 공모 수상. 둔촌이집문학상 외 다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