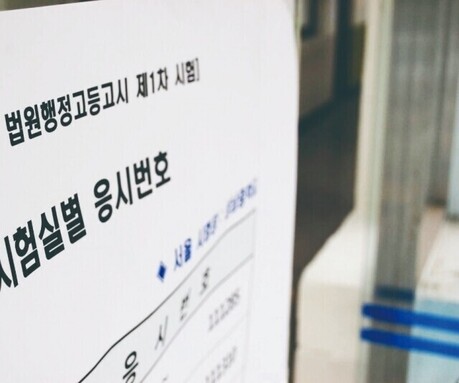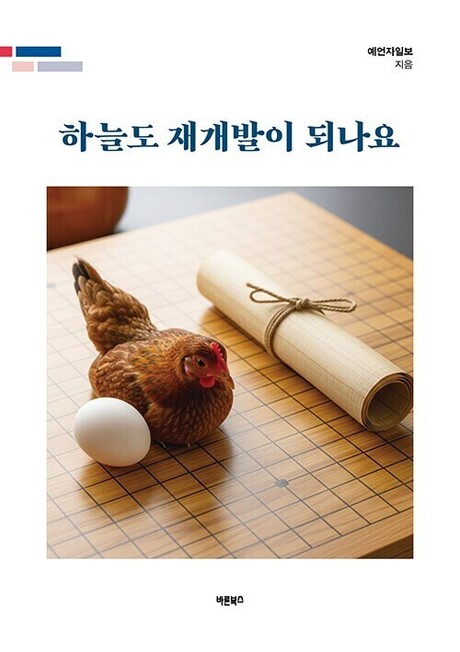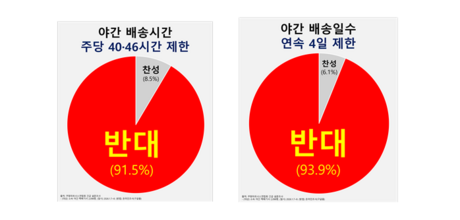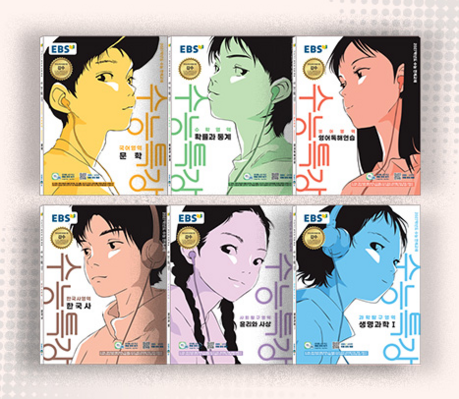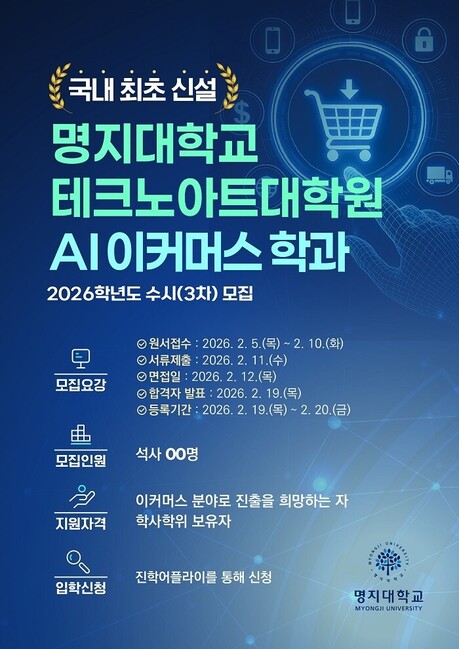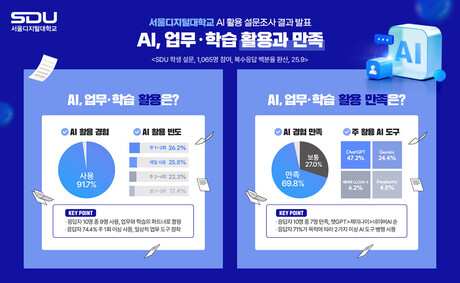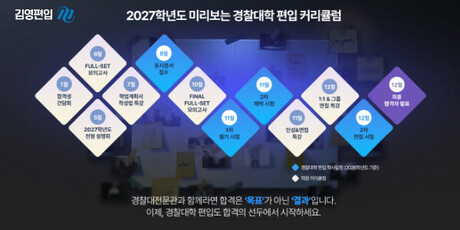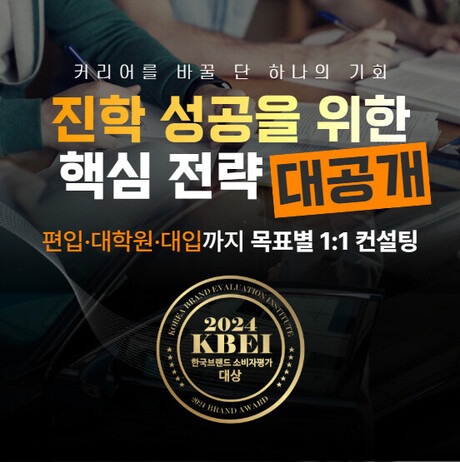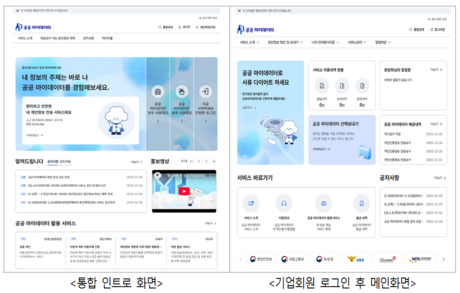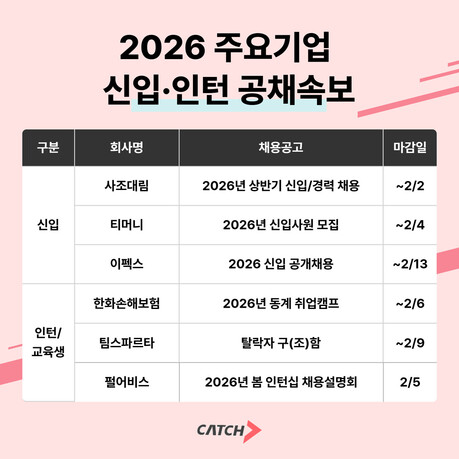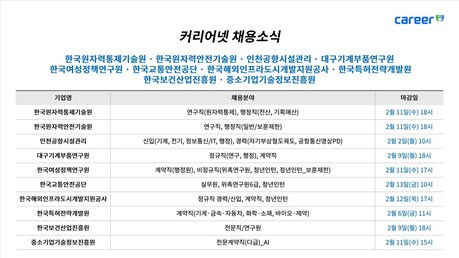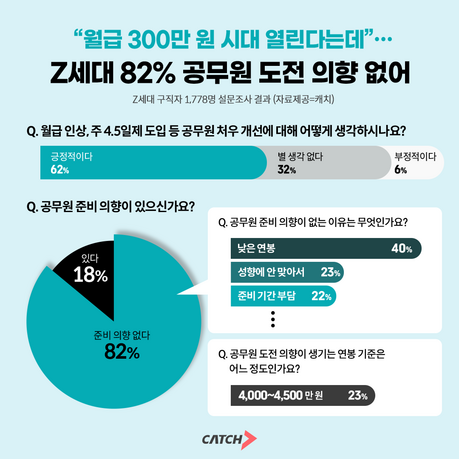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비리가 드러난 이들은 법원·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 집행유예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 변호사법이 그 결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라며 “실제로 그동안 비리법조인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의 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입법청원은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점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결격기간을 연장하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운동을 전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