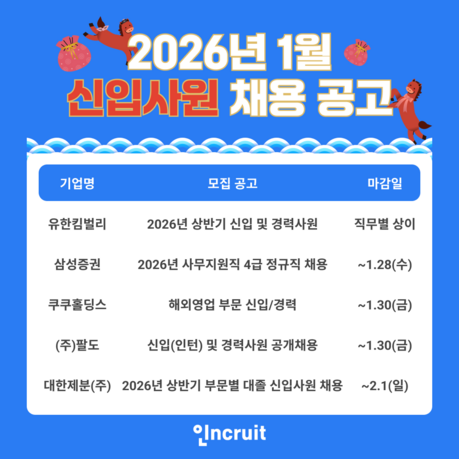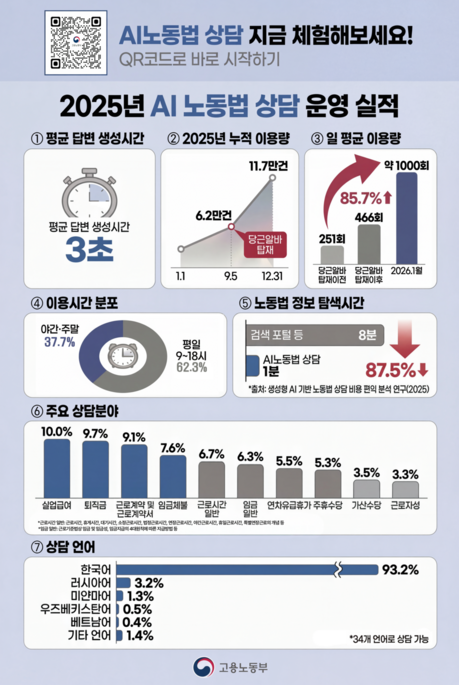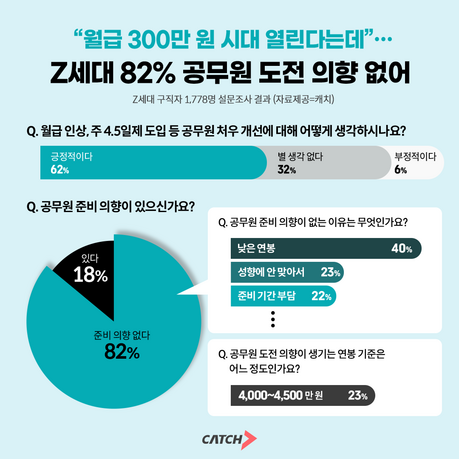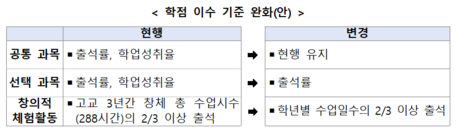어떤 항해
김 문호
 |
부정기 화물선(tramp)이라는 영문 단어가 방랑자나 떠돌이의 뜻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호주로의 항해는 뜻밖이었습니다. 당시의 동남아 부정기항로라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시멘트 철재 등, 기초 공산품을 싣고 내려갔다가 남쪽 국가들의 농산이나 임산물을 싣고 올라오는 항해가 대종이었거든요. 더구나 자바를 남쪽으로 벗어나는 해역은 원양으로 분류되면서 허용 항해구역인 근해를 벗어나는 일이었고요.
해도, 수로지 등을 챙기고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지만, 그래도 새로운 항로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열려 있지 않았고, 낯선 항구에 닻을 내리면 달포의 정박도 십상이던 당시의 부정기 항해가 그랬습니다.
외양으로 나서면서 전신세척을 받은 선체의 공선항해가 경쾌했습니다. 바람은 국제 풍력계급 1번의 실바람(Light air) 아니면 2번의 남실바람(Light breeze)이었고, 햇살은 수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끈하긴 해도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정동 90도 항로의 선수에서 불어오는 남실샛바람, 무역동풍 덕택이었지요.
새벽마다 선수에서 솟아오른 태양이 선체를 훑고는 선미의 석양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우현은 거대한 악어를 닮은 초록 자바 섬의 위용입니다. 그러나 인적은 없습니다. 까마득한 준령들이 바다로 내려앉는 해안을 살펴봐도 취락의 모습이 드믑니다. 간혹 새까맣게 그을린 반라의 사내들이 물새처럼 우짖어 스치면서 그래도 이곳이 인간의 영역인가 싶습니다. 어설프게 엮은 통나무 뗏목 위에서 땡볕 낚시에 몰두하는 그들이 우리네 원시의 모습인가 하면서 정겹기도 합니다.
남중을 지난 태양이 선미 쪽으로 기울면 으레 스콜입니다. 선수 수평선에서 우산 한 장을 펼친 만하던 검정구름 조각이 천정으로 확산해 와서 하늘과 바다를 차단하고는 밤톨 우박에 광풍 소나기를 쏟아 붓습니다. 바다 또한 질세라 끓어오르면 흑암 속의 선체가 종횡으로 나부낍니다. 매일 한 차례 시간여의 광란이었지요.
하늘과 바다가 원형으로 돌아오면 적도무풍대(Doldrums)의 중참나절이 서늘해집니다. 북반구 고향의 풀벌레 소리라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미 쪽 수평선에서 석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잠재우는 바다와 하늘, 구름의 채색과 조형의 잔치입니다. 단연 남지나해의 석양이라지만, 이곳 자바 해의 저녁놀 또한 곱고 무성하기가 그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지는 않습니다.
석양이 스러지면서 아직은 훤한 남쪽 하늘 중허리로 네 개의 일등성이 뜹니다. 남십자성. 호주와 뉴질랜드 국기에 흰 십자가로 박힌 바로 그 별자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바의 스카이라인 위로 남은 노을이 마치 십자가 성좌에서 흘러내린 무엇에 흡사하기도 합니다.
항해의 이정표가 되는 다른 일등성들도 굵고 밝게 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도를 재고 계산하는 번잡은 없습니다. 자바의 숲이 야수의 눈빛인 양 쏘아주는 등대의 섬광 덕택입니다. 낯 동안의 등탑들이 울창한 숲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풍파도 없는 남국의 일주일여 지문항해(地文航海)가 무료하도록 편했습니다.
발리, 플로레스, 알로하 등, 순다 열도와 동티모르를 지나 남동으로 꺽은 사흘 항해로 닻을 내린 호주 북단 카펜타리아 대 만(great gulf)의 그루트아일란트. 아침안개가 걷히면서 고추잠자리를 닮은 헬리콥터 한 대가 갑판으로 내려앉더니 키 큰 사내가 갑판으로 내려섰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하얀 통 작업복을 예복처럼 차려입은 백인사내.
하늘과 바다, 숲만 무성할 뿐, 오고가는 배 한 척 없는 열흘간의 오지항해로 찾아든 무인지경에서 만나는, 키 크고 새하얀 사내의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케이프 혼 바다에 살면서 순백의 자태와 우아한 비상으로 뭇 새들을 제압한다는 신천옹(Albatross)의 하강이라도 되는 듯 말이지요.
그의 조타 지휘로 접안한 부두는 중형선 한 척이 붙을 만한 목재 안벽과 망간광석 더미, 선적용 크레인 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산호섬의 울창한 수림뿐, 예의 신천옹 사내외의 인적이 없었습니다.
대형 컨베이어 벨트가 선창을 오가면서 광석을 쏟아 붓는 방식이어서, 5천여 톤을 싣는 작업이 한나절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출항할 수는 없습니다. 선창마다 피라미드처럼 쌓인 광석더미 상태로 항해에 나서기가 거리끼는 일이었지요. 무인지경 항구의 화물 고르기(Trimming) 작업은 영락없는 선원들의 몫이었고요.
어둠이 내리자, 적막하던 부두가 묵직한 새소리들로 요란해졌습니다. 공작새나 칠면조만 한 몸피에 삼원색 나래를 퍼덕이며 낮의 숲 가지를 옮겨 앉던 그들일 터였지요. 선원들의 작업등 불빛이 그들에겐 축제의 불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선실 등이 꺼지자, 부두 대신 바다 쪽이 수선스러워집니다. 푸우 푸 물을 뿜는 고래들의 숨소리였지요. 아침 입항에 선체를 에워싸며 따라 붙던 유선형 거구들이 현창너머에서 나의 밤을 함께 한다는 감흥이 수면을 거부합니다. 갑판으로 나서자, 천지는 완벽한 흑암이었고, 하늘 가득 주먹만 한 별들이 정수리를 칠 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반구의 별자리들이 낯설었습니다. 열흘여의 편한 항해를 하면서 밤하늘의 길동무들을 사귀지 않은 탓이었지요. 그래도 은하수는 손색없이 환하게 천공을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강물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잠이 영 달아나버린 밤을 지내면서도 내가 도리어 풋풋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또한 그곳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린 듯 말입니다.
별꽃들이 스러지면서 새벽이 열리자, 신천옹 사내가 어제처럼 갑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부두에서 풀려난 배의 스크루가 바다를 차기 시작하자, 고래 떼가 또다시 선측을 싸고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송별의 의식이었던 지요. 자기보다 크거나 빠른 몸피에 대한 호기의 속성이라지만, 그래도 반갑고 고마운 동행이었습니다. 신천옹이 섬으로 날아가고 선체가 전속전진의 침로를 잡자, 해면을 더욱 부풀리면서 따라붙는 그들이 내 전생의 어떤 인연이었던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영해를 벗어나면 포경선들의 무법천지거든요. 고래들도 그것을 아는지, 경계를 넘는 밤을 도와 자기들의 섬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섬 부자 인도네시아의 다도해. 해발 수 천 미터의 오벨리스크처럼 죽죽 솟은 바위섬들을 감돌아 북상하면서 적도가 가까워지면 바로 몰루카 해(Molucca sea)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항해사들이 이곳의 향료를 다투면서 대항해시대를 열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항해 역사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적도제는 색다릅니다. 포세이돈의 착한 후예임을 사뢰는 전통 의식에 이곳에서 희생된 선대 항해사들의 위령을 겸하는 것이지요.
브리지 대신 선수에 제물을 차리고 좌우로 갈라지는 바다에 술을 뿌립니다. 장성일발의 기적과 함께 선원 일동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의 시주(釃酒)를 흠향한다는 듯 원근 섬들의 메아리가 연이어 울려왔습니다. 항해사가 되길 잘 했다면서 행복했던 항해였습니다. 더구나 그때 필리핀 동안의 서태평양 북상항로는 지구상 가장 깊다는 엠덴, 챌린저 해구였거든요. 항해사라면 누구라도 호기심을 가질 만하지만 워낙 항해 교통의 오지여서 쉽지 않은 행운의 기회였습니다.
50여 년 저편의 일이 어젠 듯 선연합니다. 그때 그 뱃길을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늘 가득 내려앉던 별꽃, 나를 맞고 배웅하던 고래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배의 입항을 안내하는 파일럿에 세관, 검역, 하역, 검량인 등 일인다역의 신천옹 사내도 보고 싶네요. 기호품을 살 수 없는 선원들을 위해 썬 잎담배 한 자루와 담배 말이 종이 뭉치를 선사하던, 크고 잘 생긴 사내였습니다.
렌, 오늘에 문득 사무치는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인들 개발이라는 미명의 해찰에 지금껏 무사할까 싶은 우려일 런지요. 아니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리라는 소망이 세월에 바랜다는 자각증상인지요. 그래도 꼭 한 번 그대와 함께 다녀오고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여생에도 어김없이 달라붙는 그리움의 갈증이여.
김문호
한국해양대 졸업
대한해운공사 선장
한일상선회장
한국문협 해양문학 연구위원장
수필집 '윌리윌리' 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